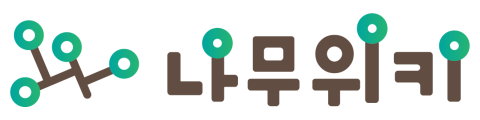
퀘벡주
최근 수정 시각:
퀘벡주 Québec | |||||||||
| |||||||||
Je me souviens 나는 기억하노라 | |||||||||
국가 | |||||||||
지역 | |||||||||
시간대 | |||||||||
면적 | 1,542,056㎢ | ||||||||
인구 | 8,695,660명 (2022) | ||||||||
인구밀도 | 5.64명/㎢ | ||||||||
종교 | |||||||||
주도 | |||||||||
최대도시 | |||||||||
공용어 | |||||||||
부총독 | 마농 자노트 (Manon Jeannotte)[2] | ||||||||
주 총리 | |||||||||
주의회 | |||||||||
연방 하원 | |||||||||
연방 상원 |
| ||||||||
상징 | 주목 | ||||||||
주화 | |||||||||
주조 | |||||||||
지역번호 | 1-263, 1-438, 1-514(이상 몬트리올) 1-354, 1-450, 1-579(이상 몬트리올 근교) 1-468, 1-819, 1-873(이상 주 서부) 1-367, 1-418, 1-581(이상 주 동부) | ||||||||
ISO 3166 | QC, CA-QC | ||||||||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le Québec(르 케베크)[3]
캐나다 동부에 있는 주. 면적은 한국(한반도)의 7배로, 캐나다에서 가장 넓은 주이며,[4] 캐나다에서 온타리오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주이다. 온타리오>퀘백>브리티시 컬럼비아 순. 전반적으로 영어가 우세한 다른 주와 달리 캐나다 프랑스어 화자가 많은 지역이다. 생로랑강 하류에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북쪽으로 올라가면 차로도 없고 이로쿼이들이나 크리 족들이 조금 살고 있고, 최북단 지역엔 이누이트가 거주한다. 사실 이렇게 원주민 사는 동네가 퀘벡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분리주의 운동이 있었다. 한때는 테러 사태가 발생하고 캐나다 육군을 동원한 계엄령까지 선포되는 등 굴곡진 20세기[5]를 겪었지만 두 차례의 독립투표가 부결된 이후로 분리독립파는 점차 세력을 잃어갔고, 21세기에 들어서부터 밀레니얼 세대들이 급진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분리주의 여론은 소강 상태에 있다.
주요 도시로는 주도인 퀘벡시와 경제의 중심지 겸 최대도시인 몬트리올이 있다. 주도인 퀘벡시는 구도시와 신도시로 나뉘어 있는데, 구도시는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 관광지로 명성이 높다.[6] 생로랑 강가에 세워진데다가 옛날의 요새, 성,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낭만적이다. 퀘벡시는 유럽인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세운 유일한 성곽도시이기도 하다. 몬트리올은 예전에는 캐나다 제일의 경제도시였으나 분리운동의 영향 때문인지 자본들이 토론토로 빠지면서 요즘은 많이 위축되었다.
주한대표부. 캐나다 헌법에 의해 퀘벡은 해외에 독자적인 대표부를 둘 수 있으며, 주한 퀘벡정부 대표부는 1991년 설립되었다. 2017년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표부 후원 아래 국내 최초로 퀘벡 영화제 및 퀘벡 관련 문화행사가 열렸고, 주한 퀘벡 대표부 명의로 책 80권을 기증하기도 했다.
흔히 알려진 '퀘벡(Quebec)'은 영어 표기와 발음을 따른 표기인데 실제로는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오기 때문에 캐나다 영어 기준으로 /kwɪˈbɛk/(퀴벡)이라 한다. 프랑스어 표기는 Québec이며 발음은 [ke.bɛk]인데 이를 외래어 표기법을 따라 표기하면 '케베크'가 된다. '퀘벡'은 북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인 알곤킨어로 '좁은 물길'을 의미하는 케페크(kepék)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Phonetic Alphabet에서 Q에 해당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현재의 캐나다 소속 퀘벡주가 생기기 전에는 온타리오주와 함께 영국령 북아메리카 내 '캐나다주'(Province of Canada, 1841~1867)를 이루고 있었다. 원래 캐나다라는 이름 자체가 현 퀘벡주 등을 좁게 가리키는 이름이었고 캐나다인이라고 하면 프랑스계 주민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을 정도.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퀘벡주 몬트리올을 연고지로 하는 NHL 팀 이름이 카나디앵 드 몽레알인 것이다. 하지만 영국령 북아메리카가 대영제국 최초의 자치령(dominion)이 될 때 캐나다라는 이름을 가져갔고 원래의 캐나다주는 퀘벡주와 온타리오주로 분할되어 캐나다에 가맹하게 된 것이다.
만약 향후에 퀘벡주가 독립하게 되면 자기의 예전 이름을 이웃나라에 갖다 바치고 나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현재의 캐나다 소속 퀘벡주가 생기기 전에는 온타리오주와 함께 영국령 북아메리카 내 '캐나다주'(Province of Canada, 1841~1867)를 이루고 있었다. 원래 캐나다라는 이름 자체가 현 퀘벡주 등을 좁게 가리키는 이름이었고 캐나다인이라고 하면 프랑스계 주민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을 정도.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퀘벡주 몬트리올을 연고지로 하는 NHL 팀 이름이 카나디앵 드 몽레알인 것이다. 하지만 영국령 북아메리카가 대영제국 최초의 자치령(dominion)이 될 때 캐나다라는 이름을 가져갔고 원래의 캐나다주는 퀘벡주와 온타리오주로 분할되어 캐나다에 가맹하게 된 것이다.
만약 향후에 퀘벡주가 독립하게 되면 자기의 예전 이름을 이웃나라에 갖다 바치고 나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표어는 "Je me souviens(나는 기억하노라)." 이는 자신들의 선조들의 전통, 혈연, 기억을 잇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퀘벡인들과 영어권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는 더 섬뜩한 의미로 통하는 표어이다. 저기서 기억한다는 의미는 영국령 캐나다에 합병된 뒤 프랑스어권 캐나다인들이 영어권 캐나다인들로부터 겪었던 차별의 역사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인 인식이라, 퀘벡 경찰과 온타리오 경찰 두 명의 공동 수사를 그리는 bon cop bad cop이라는 캐나다 영화에서 작중 토론토 경찰인 마틴 워드가 이 표어에 관해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언급하는 장면이 나온다.[7] 게다가 이 한이 맺힌 표어를 퀘벡주 자동차 번호판 위에 버젓이 적어놓기까지 하니 온 도로 위에 이런 문구가 돌아다녀 이목을 끈다.[8][9]
캐나다의 모든 주들 유일하게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표기된 주 표어이며, 평화국가로서 대외 이미지가 밝고 명랑한 편인 캐나다에도 복잡한 집안 사정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셈이다.
퀘벡인들과 영어권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는 더 섬뜩한 의미로 통하는 표어이다. 저기서 기억한다는 의미는 영국령 캐나다에 합병된 뒤 프랑스어권 캐나다인들이 영어권 캐나다인들로부터 겪었던 차별의 역사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인 인식이라, 퀘벡 경찰과 온타리오 경찰 두 명의 공동 수사를 그리는 bon cop bad cop이라는 캐나다 영화에서 작중 토론토 경찰인 마틴 워드가 이 표어에 관해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언급하는 장면이 나온다.[7] 게다가 이 한이 맺힌 표어를 퀘벡주 자동차 번호판 위에 버젓이 적어놓기까지 하니 온 도로 위에 이런 문구가 돌아다녀 이목을 끈다.[8][9]
캐나다의 모든 주들 유일하게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표기된 주 표어이며, 평화국가로서 대외 이미지가 밝고 명랑한 편인 캐나다에도 복잡한 집안 사정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셈이다.

북퀘벡 현은 대표적으로 세 지방으로 나뉜다.
Jamésie. 55도선 이남에 있다.
- 치보우가마우(Chibougamau): 북퀘벡 현 전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 사그네(Saguenay): 퀘벡시로부터 약 200km 거리에 위치한 도시로 생장호수 일대에서 최대도시이다. 종키에르(Jonquière)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퀘벡주 내 인구 8위 도시.
퀘벡을 상징하는 공식적인 주의 노래는 없다. 그러나 퀘벡 분리주의 진영에서는 1975년에 만들어진 Gens du pays(나라의 사람들)이 비공식 국가 역할을 한다.
이 노래는 퀘벡의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질 비뇨(Gilles Vigneault)가 작사 및 작곡했다. 내용은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자는 훈훈한 가사다.
20세기 초반까지는 현재 캐나다의 국가인 O Canada가 퀘벡인을 상징하는 노래로 쓰인 바 있으나 20세기 초반에 캐나다의 국가로 쓰이기 시작한 이래로 퀘벡인만을 상징하는 노래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노래는 퀘벡의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질 비뇨(Gilles Vigneault)가 작사 및 작곡했다. 내용은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자는 훈훈한 가사다.
20세기 초반까지는 현재 캐나다의 국가인 O Canada가 퀘벡인을 상징하는 노래로 쓰인 바 있으나 20세기 초반에 캐나다의 국가로 쓰이기 시작한 이래로 퀘벡인만을 상징하는 노래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후렴 | Gens du pays, c’est votre tour De vous laisser parler d’amour Gens du pays, c’est votre tour De vous laisser parler d’amour |
1 | Le temps que l’on prend pour dire Je t’aime C’est le seul qui reste au bout de nos jours Les voeux que l’on fait, les fleurs que l’on sème Chacun les récolte en soi-même Au beau jardin du temps qui court |
2 | Le temps de s’aimer, le jour de le dire Fond comme la neige aux doigts du printemps Fêtons de nos joies, fêtons de nos rires Ces yeux où nos regards se mirent C’est demain que j’avais vingt ans |
3 | Le ruisseau des jours aujourd’hui s’arrête Et forme un étang où chacun peut voir Comme en un miroir l’amour qu’il reflète Pour ces coeurs à qui je souhaite Le temps de vivre leurs espoirs |
해석
후렴 | 나라의 사람들,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사람들,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
1 | 우리가 당신을 사랑해를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 우리의 마지막 날에 남은 건 그것뿐이죠 우리가 바라는 소원, 우리가 뿌린 꽃 모두가 스스로 수확해요 짧은 시간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
2 | 서로 사랑하는 시간, 그것을 말하는 날 봄의 손가락에 눈처럼 녹아버리죠 우리의 기쁨을 축하해요, 우리의 웃음을 축하해요 우리의 시선이 비치는 이 눈 내가 스무살이 된 것은 내일이예요 |
3 | 오늘의 흐름이 멈추어요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연못을 만들어요 거울에 비친 사랑처럼 내가 바라는 이 마음들을 위해 여러분의 희망을 실현할 시간이예요 |
퀘벡인은 크리족, 이누이트 등 퀘벡 원주민, 프랑스계 캐나다인, 아일랜드계 캐나다인, 이탈리아계 캐나다인, 한국계 캐나다인 등으로 구성된 퀘벡에 살며 캐나다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크리족, 이누이트 등 퀘벡 원주민들과 전세계의 여러 지역을 뿌리로 둔 이민자들과 이민자들의 후손인 퀘벡인을 무작정 프랑스계 캐나다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프랑스계 캐나다인 외 집단을 제외하는 심각한 인종차별적인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들 중에도 퀘벡 바깥에 살며 실생활에서의 언어는 그냥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둘을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프랑스어를 쓰고 프랑스의 문화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제 프랑스 사람들과는 차이가 많다. 퀘벡에서는 다른 캐나다 지역과 비슷하게 아이스하키, 캐나디안 풋볼, 라크로스의 인기가 많고 프랑스 본토에서는 축구, 럭비, 테니스의 인기가 많다. 그리고 프랑스에 비해 영어권과 더 비슷한 측면도 많다.
퀘벡에서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 프랑스계 조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느 이민사회가 그렇듯이 다양한 혈통이 섞여있다. 특히 캐나다의 온타리오 및 다른 지역에서는 가톨릭이 아닌 성공회 및 개신교의 영향도 강했지만 퀘벡은 닥치고 가톨릭, 심할 정도로 가톨릭, 해도 너무할 정도로 가톨릭(...)[10]이었다보니 퀘벡 정착을 선택한 남유럽 및 아일랜드 출신 천주교도들이 적지 않다. 특히 아일랜드계는 아예 역사적으로 이민 유입 통로가 노바스코샤보다 퀘벡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냥 퀘벡에 정착하여 세대가 교체될수록 영어마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태이고, 남유럽과 중남미 이민자들은 모어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등 로망스어군 언어인지라 불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편이기도 하다. 이런 출신성분을 가진 아일랜드계 퀘벡인 캐나다 총리도 배출된 바 있다.
즉, 퀘벡인은 퀘벡에 살며 캐나다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다. 퀘벡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하고 물어본다면 캐나다 프랑스어 화자의 대다수는 캐나다인이라기보다는 Québécois(e)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영어 화자에게 묻는다면 거의 모두 캐나다인이라고 답할 것이다. 성씨가 프랑스계인 사람이라도 다른 주에서 영어를 쓰며 살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를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권 캐나다인이 영국인이 아니듯 퀘벡인들 역시 프랑스어를 쓴다고 해서 프랑스인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 전 프랑스 본토로부터 방치된 이후 퀘벡인들중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스스로를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퀘벡의 Canadien(ne)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쉽게 이해하자면 프랑스나 영국, 더 나아가 캐나다로부터도 죄다 독립한 퀘벡인 정도이다.
통계도 제각각인 측면이 있는데, 한 통계에 따르면 28.9%의 퀘벡인이 스스로를 프랑스계라고 답했으나 스스로를 캐나다인이라고 답한 퀘벡인은 60.1%이었다.
한편 2010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프랑스어의 퀘벡 프랑스어 화자들의 3분의 1은 자신을 오롯이 '퀘벡인'(Québécois, 케베쿠아)이라고 지칭하고, 39%는 '캐나다인'이라고 인식은 하나 그 전에 앞서 '퀘벡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한다고 한다. 약 20% 미만이 자신을 '퀘벡인이자 동시에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하고, 7%는 자신을 '퀘벡인' 전에 '캐나다인'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오직 '캐나다인'이라고만 소개하는 사람들은 1%에 그쳤다.#[11]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퀘벡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에도 소수나마 살고 있다는 것[12]이다. 특히 노바스코샤주와 뉴브런즈윅주에 살고 있는 아카디앵(Acadien)들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스스로를 퀘벡인들과 완전히 남남이라고 인식한다. 뉴브런즈윅에서는 아예 영어와 불어가 대등한 공용어로 지정되어있을 정도. 가까운 온타리오에도 스스로를 프랑코옹타리앵(Franco-Ontarien)이라 칭하는 소수의 프랑스계가 있으며,[13] 한국에도 《내 생애의 아이들》 등의 작품이 번역된 퀘벡 소설의 대모 가브리엘 루아(Gabrielle Roy)도 매니토바주 위니펙의 프랑스어권 동네 생보니파스(Saint-Boniface) 출신이다. 이런 다른 동네 프랑코폰 중에서도 로메오&도미닉 르블랑 부자(뉴브런즈윅), 폴 마틴 부자(온타리오)나 피에르 폴리에브(앨버타)[14] 등 성공한 정치인이 여럿 배출되기도 했다.
아카디앵들과 프랑코옹타리앵들은 각각의 프랑스어 억양이 퀘벡 프랑스어와는 또 다르다. 게다가 이렇게 대서양 연안 북미 전반의 프랑스계 커뮤니티는 국경 건너 미국에도 있다. New England French라 부르며 역사적 기원은 퀘벡, 아카디아인들과 마찬가지지만 익히 알려진 프랑스의 북미 식민지 상실, 미국 독립 전쟁, 영미간 국경 확정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 측에 살게 된 프랑스어 모어 커뮤니티는 메인, 버몬트와 뉴욕주 북쪽 끝자락에도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이들은 역사적 기원과 문화적 맥락은 프랑스계 캐나다인과 공유하지만 법적 의미로 '캐나다인'이었던 적은 한번도 없으니 굉장히 복잡미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를 보자면 7년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퀘벡과 카리브 해 식민지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는데, 이때 프랑스는 아이티 대신 돈도 안되고 골치 아픈 퀘벡을 버린다. 그렇기에 이후 샤를 드 골이 속죄한답시고 자유 퀘벡 만세를 외친 것이다. 이들에게 프랑스는 그냥 같은 말을 쓰는 나라 정도다.
게다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프랑스와의 유대감은 크지 않다. 언어만 공유할 뿐이다. 오히려 뉴욕주,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문화적으로 미국에 당연히 더 가깝다.[15]
한 예로 1917년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대영제국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것에 영 관심이 없는 퀘벡인들을 꼬시기 위해 당시 보수당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프랑스를 도웁시다라는 캠페인까지 벌였는데 퀘벡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왜 남의 나라를 도와야 하나요?"였다. 사실 그럴 만도 한게 퀘벡인들이 프랑스어만 쓸 뿐 프랑스계만 있는 것도 아닌 데다가 이때만 해도 벌써 프랑스와 주종의 연이 끊어진 지 150년도 더 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영국계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 흑인, 미국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이 영국에 전혀 동질감이 없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에 보수당 정부는 징병까지 실행했으나 도리어 역효과로 항쟁까지 불러오고, 그러다 전쟁이 1년 뒤에 끝나자 이 일은 흐지부지 마무리되어 더 큰 사건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향후 70년간 퀘벡주 연방총선에서는 1958년을 제외하면 모두 캐나다 자유당이 승리하게 된다.[16]
다만 제2차 세계 대전 때는 사정이 좀 달라져서, 이때는 연합군을 도와 추축국과 싸우기 위해 퀘벡인들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오기도 했다.[17]
프랑스어를 쓰고 프랑스의 문화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제 프랑스 사람들과는 차이가 많다. 퀘벡에서는 다른 캐나다 지역과 비슷하게 아이스하키, 캐나디안 풋볼, 라크로스의 인기가 많고 프랑스 본토에서는 축구, 럭비, 테니스의 인기가 많다. 그리고 프랑스에 비해 영어권과 더 비슷한 측면도 많다.
퀘벡에서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 프랑스계 조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느 이민사회가 그렇듯이 다양한 혈통이 섞여있다. 특히 캐나다의 온타리오 및 다른 지역에서는 가톨릭이 아닌 성공회 및 개신교의 영향도 강했지만 퀘벡은 닥치고 가톨릭, 심할 정도로 가톨릭, 해도 너무할 정도로 가톨릭(...)[10]이었다보니 퀘벡 정착을 선택한 남유럽 및 아일랜드 출신 천주교도들이 적지 않다. 특히 아일랜드계는 아예 역사적으로 이민 유입 통로가 노바스코샤보다 퀘벡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냥 퀘벡에 정착하여 세대가 교체될수록 영어마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태이고, 남유럽과 중남미 이민자들은 모어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등 로망스어군 언어인지라 불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편이기도 하다. 이런 출신성분을 가진 아일랜드계 퀘벡인 캐나다 총리도 배출된 바 있다.
즉, 퀘벡인은 퀘벡에 살며 캐나다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다. 퀘벡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하고 물어본다면 캐나다 프랑스어 화자의 대다수는 캐나다인이라기보다는 Québécois(e)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영어 화자에게 묻는다면 거의 모두 캐나다인이라고 답할 것이다. 성씨가 프랑스계인 사람이라도 다른 주에서 영어를 쓰며 살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를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영어권 캐나다인이 영국인이 아니듯 퀘벡인들 역시 프랑스어를 쓴다고 해서 프랑스인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 전 프랑스 본토로부터 방치된 이후 퀘벡인들중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스스로를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퀘벡의 Canadien(ne)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쉽게 이해하자면 프랑스나 영국, 더 나아가 캐나다로부터도 죄다 독립한 퀘벡인 정도이다.
통계도 제각각인 측면이 있는데, 한 통계에 따르면 28.9%의 퀘벡인이 스스로를 프랑스계라고 답했으나 스스로를 캐나다인이라고 답한 퀘벡인은 60.1%이었다.
한편 2010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프랑스어의 퀘벡 프랑스어 화자들의 3분의 1은 자신을 오롯이 '퀘벡인'(Québécois, 케베쿠아)이라고 지칭하고, 39%는 '캐나다인'이라고 인식은 하나 그 전에 앞서 '퀘벡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한다고 한다. 약 20% 미만이 자신을 '퀘벡인이자 동시에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하고, 7%는 자신을 '퀘벡인' 전에 '캐나다인'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오직 '캐나다인'이라고만 소개하는 사람들은 1%에 그쳤다.#[11]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퀘벡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에도 소수나마 살고 있다는 것[12]이다. 특히 노바스코샤주와 뉴브런즈윅주에 살고 있는 아카디앵(Acadien)들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스스로를 퀘벡인들과 완전히 남남이라고 인식한다. 뉴브런즈윅에서는 아예 영어와 불어가 대등한 공용어로 지정되어있을 정도. 가까운 온타리오에도 스스로를 프랑코옹타리앵(Franco-Ontarien)이라 칭하는 소수의 프랑스계가 있으며,[13] 한국에도 《내 생애의 아이들》 등의 작품이 번역된 퀘벡 소설의 대모 가브리엘 루아(Gabrielle Roy)도 매니토바주 위니펙의 프랑스어권 동네 생보니파스(Saint-Boniface) 출신이다. 이런 다른 동네 프랑코폰 중에서도 로메오&도미닉 르블랑 부자(뉴브런즈윅), 폴 마틴 부자(온타리오)나 피에르 폴리에브(앨버타)[14] 등 성공한 정치인이 여럿 배출되기도 했다.
아카디앵들과 프랑코옹타리앵들은 각각의 프랑스어 억양이 퀘벡 프랑스어와는 또 다르다. 게다가 이렇게 대서양 연안 북미 전반의 프랑스계 커뮤니티는 국경 건너 미국에도 있다. New England French라 부르며 역사적 기원은 퀘벡, 아카디아인들과 마찬가지지만 익히 알려진 프랑스의 북미 식민지 상실, 미국 독립 전쟁, 영미간 국경 확정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 측에 살게 된 프랑스어 모어 커뮤니티는 메인, 버몬트와 뉴욕주 북쪽 끝자락에도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이들은 역사적 기원과 문화적 맥락은 프랑스계 캐나다인과 공유하지만 법적 의미로 '캐나다인'이었던 적은 한번도 없으니 굉장히 복잡미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를 보자면 7년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퀘벡과 카리브 해 식민지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는데, 이때 프랑스는 아이티 대신 돈도 안되고 골치 아픈 퀘벡을 버린다. 그렇기에 이후 샤를 드 골이 속죄한답시고 자유 퀘벡 만세를 외친 것이다. 이들에게 프랑스는 그냥 같은 말을 쓰는 나라 정도다.
게다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프랑스와의 유대감은 크지 않다. 언어만 공유할 뿐이다. 오히려 뉴욕주,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문화적으로 미국에 당연히 더 가깝다.[15]
한 예로 1917년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대영제국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것에 영 관심이 없는 퀘벡인들을 꼬시기 위해 당시 보수당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프랑스를 도웁시다라는 캠페인까지 벌였는데 퀘벡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왜 남의 나라를 도와야 하나요?"였다. 사실 그럴 만도 한게 퀘벡인들이 프랑스어만 쓸 뿐 프랑스계만 있는 것도 아닌 데다가 이때만 해도 벌써 프랑스와 주종의 연이 끊어진 지 150년도 더 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영국계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 흑인, 미국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이 영국에 전혀 동질감이 없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에 보수당 정부는 징병까지 실행했으나 도리어 역효과로 항쟁까지 불러오고, 그러다 전쟁이 1년 뒤에 끝나자 이 일은 흐지부지 마무리되어 더 큰 사건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향후 70년간 퀘벡주 연방총선에서는 1958년을 제외하면 모두 캐나다 자유당이 승리하게 된다.[16]
다만 제2차 세계 대전 때는 사정이 좀 달라져서, 이때는 연합군을 도와 추축국과 싸우기 위해 퀘벡인들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오기도 했다.[17]
- 참고 항목: 캐나다 프랑스어
1977년 퀘벡주 의회에서 통과된 Bill 101의 영향으로 프랑스어가 유일한 공용어이다. 미국과 영어권 캐나다에서 영국 영어를 쓰는 사람이 드물고 놀림받는 경우가 허다하듯, 프랑스어권 캐나다에서는 본토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드물고 놀림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퀘벡주는 교육환경에서도 프랑스어가 우세하여, 한국의 고3, 대학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대학 예비학교인 CEGEP 과정도 프랑스어 학교가 주류이다. 퀘벡 주민들이 퀘벡 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선 CEGEP에 진학해야 하며, 대학진학 희망자들은 2년 과정을 밟고 고졸취업 희망자들은 3년 과정을 밟는다. 토론토 대학교 등 지역 바깥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굳이 안 가도 된다.
그러나 21세기 이후 프랑스어권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영어권 CEGEP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주법 14조를 통해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한 퀘벡 주정부도 고심하고 있는 중. 몬트리올에선 영어권 CEGEP도 있어서 그나마 사정이 나으나 퀘벡시에서는 2016년 시내 유일한 영어권 CEGEP 입학 희망 인원이 정원을 350명이나 초과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프랑스어 몰입교육과정 등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2013년 퀘벡주 영어권 CEGEP 학생들이 졸업에 프랑스어 시험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반발하여 집단으로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역 스포츠팀 카나디앵 드 몽레알에서도 SNS 계정에서 프랑스어와 영어 게시물을 각각 따로 올리며, 감독을 선정할 때 영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 한 때 랜디 커니워스(Randy Cunneyworth)가 감독대행으로 취임했을 때 프랑스어를 하나도 못한다고 몬트리올 미디어와 팬덤에서 대차게 까여서, 오너인 제프 몰슨이 공개사과를 하고 다음 후임 감독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겠다고 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커니워스 본인도 감독을 하는 동안에 최대한 프랑스어를 배우겠다고 약속했었다.
퀘벡주에도 영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이 대략 10% 정도 있다. 영어권 주민의 역사가 오래된 몬트리올이나 오타와가 가까운 가티노와 같은 도시, 영어권 지역[18]과 접경하는 지역에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 프랑스어를 몰라도 일상 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모든 간판은 프랑스어로만 되어 있고 영어 한 마디도 못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리고 몬트리올에서조차 영어는 번화가의 식당, 쇼핑몰, 호텔, 일부 소비업, 국제공항과 관공서 등에서나 통용된다. 엔지니어들의 경우엔 영어만 해도 되는 직장들이 소수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프랑스어가 공용어인 만큼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거나 단순한 일상 생활 너머의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상당하다.
퀘벡에서도 여타 캐나다 지역으로 일하러 가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으며 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친다.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수준급의 프랑스어 실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퀘백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직업을 갖기 위해선 영어를 필수로 배워야 한다. 때문에 젊은이들이나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체로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한다.
캐나다 토익 성적이 1등이라는 사실에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퀘벡주 사람들이 본토로 나오기 위해서는 영어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TOEIC을 보는 것이다. 퀘벡주 사람들에게 영어는 엄연한 외국어이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권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듯 퀘벡 사람들도 자국의 영어권 주들로 어학연수를 가곤 한다. 반대로 퀘벡주로 프랑스어를 배우러 오는 영어권 캐나다인들도 많다.
그러나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모든 간판은 프랑스어로만 되어 있고 영어 한 마디도 못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리고 몬트리올에서조차 영어는 번화가의 식당, 쇼핑몰, 호텔, 일부 소비업, 국제공항과 관공서 등에서나 통용된다. 엔지니어들의 경우엔 영어만 해도 되는 직장들이 소수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프랑스어가 공용어인 만큼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구하거나 단순한 일상 생활 너머의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상당하다.
퀘벡에서도 여타 캐나다 지역으로 일하러 가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으며 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친다.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수준급의 프랑스어 실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퀘백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직업을 갖기 위해선 영어를 필수로 배워야 한다. 때문에 젊은이들이나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체로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한다.
캐나다 토익 성적이 1등이라는 사실에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퀘벡주 사람들이 본토로 나오기 위해서는 영어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TOEIC을 보는 것이다. 퀘벡주 사람들에게 영어는 엄연한 외국어이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권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듯 퀘벡 사람들도 자국의 영어권 주들로 어학연수를 가곤 한다. 반대로 퀘벡주로 프랑스어를 배우러 오는 영어권 캐나다인들도 많다.
누나빅이라는 지역에서 쓰인다. 누나빅은 퀘벡 북쪽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 지역은 아북극 지역으로 인구가 극히 희박하고 그 인구조차 절대 다수 이누이트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이다. 퀘벡 남쪽의 통상적인 프랑스어권과는 다른 지역이다.
누나빅은 이눅티툿의 누나빅사투리 로 위대한 땅을 뜻하고 이 지역의 이누이트들은 스스로를 누나빔미웃(Nunavimmiut)이라고 부른다. 1912년까지 이 지역은 노스웨스트 준주 웅가바 지역의 일부였다.
2000년대에는 지역 자치권과 미결 토지 청구 해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소재지는 쿠웃주악(Kuujjuaq)이 될 것이다. 누나빅 지역에서 이누이트의 정치적 권리를 더 잘 강화하기 위한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누나빅의 깃발은 2013년 4월 누나빅의 아티스트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토마시 망기옥이 만들었다.
누나빅은 이눅티툿의 누나빅사투리 로 위대한 땅을 뜻하고 이 지역의 이누이트들은 스스로를 누나빔미웃(Nunavimmiut)이라고 부른다. 1912년까지 이 지역은 노스웨스트 준주 웅가바 지역의 일부였다.
2000년대에는 지역 자치권과 미결 토지 청구 해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소재지는 쿠웃주악(Kuujjuaq)이 될 것이다. 누나빅 지역에서 이누이트의 정치적 권리를 더 잘 강화하기 위한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누나빅의 깃발은 2013년 4월 누나빅의 아티스트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토마시 망기옥이 만들었다.
원래는 타 지역이 그렇듯이 소수의 원주민들이 살던 곳으로 1534년 프랑스의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이 지역을 발견하여 이 일대를 프랑스 왕령으로 선언하였다. 1604년 사뮈엘 드 샹플랭(Samuel de Champlain)이 펀디 만 일대를 탐험하고 원주민과 모피를 교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겨울을 나는 법을 배운 샹플랭 일행은 그 일대에 일시적으로 정착을 하였다. 하지만 남쪽의 잉글랜드인들의 북상에 위협을 느낀 샹플랭은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세인트로렌스강을 거슬러 올라가 1608년 모피 교역소를 세웠는데 이 교역소가 퀘벡시의 시초가 된다.
이후 이 일대는 식민지화가 진행되었다. 리슐리외에 의하여 일백조합인상사(Compagnie des Cent-Associés)가 설립되어 식민지 교역을 독점하며 지속적으로 원주민과의 모피 교역을 확장해 나갔다. 몬트리올도 이러한 확장을 통해서 1642년 건설된 도시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적은 인구로 인하여 식민지 운영이 쉽지 않았고, 루이 14세는 왕의 딸들이라 불리게 되는 약 800명의 여자들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 '왕의 딸들'을 소재로 한 소설이 있다.
1660년 당시, 프랑스 정착민들의 인구는 겨우 2500명이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 프랑스 정착민들이 상당수 왔지만, 죽거나 프랑스로 되돌아가는 수도 많았다. 그러나 왕의 딸이 정착한 이후로는 인구는 이민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매년 2% 이상씩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는 프랑스 본토의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오늘날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계 1천만 명 가운데 다수는 초기 정착민 2,600명의 후손들이라고 하며, 이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적어 관련 의학 연구에 유용하다고 한다.
하지만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결과 맺어진 위트레흐트 조약에서 루퍼츠랜드와 뉴펀들랜드 섬, 노바스코샤 지역이 영국에 할양되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여전히 퀘벡을 포함해 캐나다의 대부분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다. 1756년 일어난 프랑스-인디언 전쟁은 퀘벡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오하이오 지역에서 영국군과 충돌한 프랑스군은 루이 조제프 드 몽캄 후작의 지휘 하에 주요 전투에서 승리를 하며 영국군을 봉쇄했는데 1758년에 이르러 영국의 피트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제임스 울프 장군과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역공을 개시한다.
이러한 역공으로 인해 프랑스군은 퀘벡시 일대까지 물러났다. 1759년 9월 퀘벡 근교의 아브라함 평원에서 양측 군대가 회전을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루이 조제프 드 몽캄 후작과 제임스 울프 장군 모두 전사를 하는 격전 끝에 영국군이 승리하였고 완전히 포위를 당한 퀘벡시는 결국 영국군에게 항복한다.
그렇지만 아직 몬트리올의 프랑스군과 총독은 항복하지 않았고, 이들은 본국에서의 지원을 기다리며 퀘벡을 탈환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퇴각했다. 이때는 이미 본국의 수송선이 영국 해군과의 해전에서 패퇴한 시점이었다. 결국 1759년 영국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7년 전쟁의 종결과 함께 맺어진 파리 조약에 따라서 퀘벡은 영국에게 할양되었다.
말하자면 신세계를 정복하려고 왔다가 자신들이 정복당한 상황. '정복당한 정복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1660년 당시, 프랑스 정착민들의 인구는 겨우 2500명이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 프랑스 정착민들이 상당수 왔지만, 죽거나 프랑스로 되돌아가는 수도 많았다. 그러나 왕의 딸이 정착한 이후로는 인구는 이민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매년 2% 이상씩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는 프랑스 본토의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오늘날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계 1천만 명 가운데 다수는 초기 정착민 2,600명의 후손들이라고 하며, 이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적어 관련 의학 연구에 유용하다고 한다.
하지만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결과 맺어진 위트레흐트 조약에서 루퍼츠랜드와 뉴펀들랜드 섬, 노바스코샤 지역이 영국에 할양되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여전히 퀘벡을 포함해 캐나다의 대부분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다. 1756년 일어난 프랑스-인디언 전쟁은 퀘벡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오하이오 지역에서 영국군과 충돌한 프랑스군은 루이 조제프 드 몽캄 후작의 지휘 하에 주요 전투에서 승리를 하며 영국군을 봉쇄했는데 1758년에 이르러 영국의 피트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제임스 울프 장군과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역공을 개시한다.
이러한 역공으로 인해 프랑스군은 퀘벡시 일대까지 물러났다. 1759년 9월 퀘벡 근교의 아브라함 평원에서 양측 군대가 회전을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루이 조제프 드 몽캄 후작과 제임스 울프 장군 모두 전사를 하는 격전 끝에 영국군이 승리하였고 완전히 포위를 당한 퀘벡시는 결국 영국군에게 항복한다.
그렇지만 아직 몬트리올의 프랑스군과 총독은 항복하지 않았고, 이들은 본국에서의 지원을 기다리며 퀘벡을 탈환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퇴각했다. 이때는 이미 본국의 수송선이 영국 해군과의 해전에서 패퇴한 시점이었다. 결국 1759년 영국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7년 전쟁의 종결과 함께 맺어진 파리 조약에 따라서 퀘벡은 영국에게 할양되었다.
말하자면 신세계를 정복하려고 왔다가 자신들이 정복당한 상황. '정복당한 정복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전쟁의 와중에 충성심에 의문을 품고 강제로 축출시킨 아카디아인[19]들을 제외하면, 1763년 파리 조약 이후 퀘벡인들은 그럭저럭 영국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고 여전히 그들의 언어와 종교 그리고 민법을 고수할 수 있었다. 7년전쟁 직후에는 영어 강요 등 문화적 탄압이 일정 부분 이뤄지긴 했지만, 영국의 북미 식민지 경영도 재정상으로 빠듯해지고 남쪽 13개주에서 더 큰 문제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미국(당시에는 대륙 의회)이 오대호에서 대서양으로 흐르는 생로랑강 일대(사실상 퀘벡의 정착지 전부)를 접수하면 노바스코샤의 영국 해군기지가 끊기고 북아메리카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영국은 이를 고려하고 퀘벡의 언어적,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하며 민심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퀘벡인들도 자신들을 북미에다 내다버린 프랑스 왕국이 '13개주 역적놈들'의 편을 드니 배알이 꼬이기도 했고, 전쟁 극초기 쳐들어온 대륙군이 영어와 개신교를 강요하니 더욱 영국 측으로 결집했다. 이를 보면 영국이 현명한 민정을 펼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퀘벡의 지정학적 알박기(...) 덕에 문화가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미국이 독립하며, 영국계 왕당파(Loyalists) 5만 명이 캐나다에 이주를 하면서 영국은 상 캐나다(Upper Canada; Haut-Canada)와 하 캐나다(Lower Canada; Bas-Canada)로 지역을 분할하였는데, 이 중 하 캐나다가 바로 지금의 퀘벡주 일대가 되었다. 참고로 이 이름은 생로랑강 상류와 오대호 인접지역이 상류라고 '상'캐나다가 되고 생로랑강 하류 지역이 하류라고 '하'캐나다가 된 것.[20] 이런 행정체제는 19세기까지 이어졌으며 이 당시 양 캐나다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자 1841년 통합령을 통해 양 캐나다를 하나로 합친다. 이어 1867년 공표된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안에 따라서 캐나다 자치령이 출범한다.
이렇게 미국이 독립하며, 영국계 왕당파(Loyalists) 5만 명이 캐나다에 이주를 하면서 영국은 상 캐나다(Upper Canada; Haut-Canada)와 하 캐나다(Lower Canada; Bas-Canada)로 지역을 분할하였는데, 이 중 하 캐나다가 바로 지금의 퀘벡주 일대가 되었다. 참고로 이 이름은 생로랑강 상류와 오대호 인접지역이 상류라고 '상'캐나다가 되고 생로랑강 하류 지역이 하류라고 '하'캐나다가 된 것.[20] 이런 행정체제는 19세기까지 이어졌으며 이 당시 양 캐나다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자 1841년 통합령을 통해 양 캐나다를 하나로 합친다. 이어 1867년 공표된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안에 따라서 캐나다 자치령이 출범한다.
캐나다 자치령은 출범 직후 4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퀘벡주였다. 캐나다 자치령은 이후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따라서 주권을 가지고 독립을 하게 된다. 이 당시 퀘벡은 상당 부분의 경제권이 영국계들에게 있었으며, 특히 미국의 산업적 발전과 연계하여 몬트리올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많은 영국계가 몬트리올에 거주하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계들은 많은 수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규범 아래에서 생활을 하였다. 일부 프랑스계들은 도시로 이주하여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그 결과 퀘벡의 주요 자본은 영국계가 장악하고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프랑스계들은 하층민으로 머물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계들은 많은 수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규범 아래에서 생활을 하였다. 일부 프랑스계들은 도시로 이주하여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그 결과 퀘벡의 주요 자본은 영국계가 장악하고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프랑스계들은 하층민으로 머물게 되었다.
20세기 초까지도 전근대적, 가톨릭적 구습에 얽매여 있던 퀘벡은 1960년대부터 이른바 '조용한 혁명'(Révolution tranquille)으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근대화, 세속화 과정을 거치며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했다.
크게 보면 세속화, 복지국가, 퀘벡(인) 주권 강화 정도로 설명될 수 있는 조용한 혁명은, 1960년 퀘벡 자유당(Parti libéral du Québec, PLQ)의 장 르사주가 퀘벡주총리에 취임하고 주 정부 주도의 개발을 실시하며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이때 퀘벡 자유당은 특이하게도 말로는 중도우파를 표방했으나 현실은 연방 자유당 의원도 지낸 르사주 총리 등의 영향인지 중도좌파스런 사민주의 색채를 많이 띄었다.[21] 이때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기존엔 영국계 자본의 소유였던 세계 최대 수력 발전회사 '이드로 케베크'(Hydro-Québec)의 국유화였다.
사회 복지와 새 노동법 통과 등 노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이후 퀘벡당 집권기에도 비슷하게 이어졌다. 정교분리 정책도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담당하고 있던 교육, 의료 부문을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프랑스어의 사용이나 프랑스계 문화 보존에 대한 법률도 지속적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퀘벡의 많은 프랑스계들이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아닌 퀘벡인으로 자기들은 재인식하는 일종의 계기가 되었다.
다만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어 금지령 등 퀘벡 정체성 찾기 정책들로 인해 당시 많은 기업들이 퀘벡을 떠나 온타리오 등 영어권 캐나다로 빠져나가고 원래 캐나다 최대 도시였던 몬트리올도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영어권의 토론토에 밀려 제2의 도시로 떨어졌으며[22], 1976년 무리한 올림픽 개최의 후유증으로 적자와 부채에 허덕이는 등 부정적 변화도 없진 않았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퀘벡 자유당은 퀘벡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퀘벡미래연합과 퀘벡당 등 여러 지역정당에서도 강경한 독립파는 힘을 잃어가는 실정이다.
크게 보면 세속화, 복지국가, 퀘벡(인) 주권 강화 정도로 설명될 수 있는 조용한 혁명은, 1960년 퀘벡 자유당(Parti libéral du Québec, PLQ)의 장 르사주가 퀘벡주총리에 취임하고 주 정부 주도의 개발을 실시하며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이때 퀘벡 자유당은 특이하게도 말로는 중도우파를 표방했으나 현실은 연방 자유당 의원도 지낸 르사주 총리 등의 영향인지 중도좌파스런 사민주의 색채를 많이 띄었다.[21] 이때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기존엔 영국계 자본의 소유였던 세계 최대 수력 발전회사 '이드로 케베크'(Hydro-Québec)의 국유화였다.
사회 복지와 새 노동법 통과 등 노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이후 퀘벡당 집권기에도 비슷하게 이어졌다. 정교분리 정책도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담당하고 있던 교육, 의료 부문을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프랑스어의 사용이나 프랑스계 문화 보존에 대한 법률도 지속적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퀘벡의 많은 프랑스계들이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아닌 퀘벡인으로 자기들은 재인식하는 일종의 계기가 되었다.
다만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어 금지령 등 퀘벡 정체성 찾기 정책들로 인해 당시 많은 기업들이 퀘벡을 떠나 온타리오 등 영어권 캐나다로 빠져나가고 원래 캐나다 최대 도시였던 몬트리올도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영어권의 토론토에 밀려 제2의 도시로 떨어졌으며[22], 1976년 무리한 올림픽 개최의 후유증으로 적자와 부채에 허덕이는 등 부정적 변화도 없진 않았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퀘벡 자유당은 퀘벡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퀘벡미래연합과 퀘벡당 등 여러 지역정당에서도 강경한 독립파는 힘을 잃어가는 실정이다.
캐나다에서 영어권 동부 지역(애틀란틱 캐나다) 등과 함께 전통적 캐나다 자유당 지지 지역이다. 특히 자유당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의 고향이자 정치적 근거지이기도 하며, 온타리오와 함께 역사상 수많은 캐나다 정계의 거물들을 배출한 주이기도 하다. 언어별 인구비중, 역사적 임팩트로 따지면 오히려 근현대 캐나다 연방정치의 대부분이 퀘벡인들에 의해 좌우되었을 정도라서, 1968년 피에르 트뤼도 이래 2006년 물러난 폴 마틴까지 38년여 동안에는 중간중간 다 합쳐야 만 2년이 채 안되는 기간을 빼면 퀘벡 출신 총리들이 캐나다를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캐나다 자유당 소속이었지만 의외로 보수세력 출신 브라이언 멀로니 총리도 있었다는게 함정.[23]
다만, 퀘벡주의 정치는 영어권에 갇힌 북미 프랑스어의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성, 영미법계의 시스템에 강하게 남은 프랑스식 대륙법계의 흔적, 퀘벡 현대사를 상징하는 조용한 혁명과 분리주의, 진보·보수의 장대하고도 난잡(...)한 이합집산이 반복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어권 캐나다 정치판과 똑같이 바라봤다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이 많다.
일단 연방 선거에서는 대개 득표율이 8(진보):2(보수) 수준으로 진보 정당이 초강세인 경우가 많은데 비해, 주 선거에서는 그 정도까진 아니라 보수층이 단일화를 잘해서 기세를 탈시엔 득표율 기준 6(진보):4(보수) 수준까지 따라붙어 후술되어있듯 소선거구제의 이점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과연 퀘벡 진보세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퀘벡 블록을 진보정당으로 대접하는게 옳은가(...) 하는 의문이다.[24]
지역적으로 따져보면, 서남부에 위치한 주 최대도시 몬트리올 광역권에서는 주로 캐나다 자유당이 강세이며, 몬트리올에서 동북부에 위치한 주도 퀘벡시와 그 광역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당 당선자도 꽤 나온다. 그 외 주로 덩치가 큰 교외 및 시골 선거구들은 퀘벡 블록이 강세를 이루는 편이다.
2011년 연방 총선때는 보수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퀘벡주에선 신민당과 퀘벡 블록의 득표율 합이 66%, 보수당은 16%를 득표했을 정도로 저조했다. 2011년 총선 당시 보수당이 66%를 득표했고 신민당은 16%를 득표한 앨버타주와는 정반대. 2019년 연방 총선에서도 총 의석 78석 중 자유당이 35석, 보수당이 10석, 퀘벡 블록이 32석, 신민당이 1석을 차지하며 진보 진영이 강세를 보였다. 득표율은 자유당 34.2%, 보수당 16%, 퀘벡 블록 32.5%, 신민당 10.7%, 녹색당 4.5%, 인민당 1.5%.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2010년대 자유당과 신민당에 지지 기반을 다 뺏기며 군소정당으로 몰락했던 퀘벡 지역 정당 퀘벡 블록이 부활했다는 점이 있다. 2021년 총선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주 선거의 경우 2018년 주 선거에서는 그동안 주의회를 장악해온 퀘벡 자유당과 퀘벡당이 무너졌다. 퀘벡미래연합이 의석수 기준 단독 과반을 채워 첫 집권에 성공했다. 다만 득표율 기준으론 37.42%밖에 득표하지 못해 여전히 진보 진영이 앞서긴 했다. 분열 효과를 톡톡히 본 셈. 한편, 이전엔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던 퀘벡연대[25]는 이 선거에서는 16%의 득표율을 얻으며, 기존 3석에서 10석으로 의석이 늘어나는 등 상당히 선전했다.
물론 보수 성향인 퀘벡미래연합도 프랑스어 보호를 위해 영어 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법을 제정하는 등# 퀘벡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민에 대해서도 상당히 빡빡하게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보수적인 농촌 지역에서는 주 선거에서는 퀘벡미래연합이 우세하고 연방 선거에서는 퀘벡 블록이 우세한 모습도 나타난다.
2020년 들어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퀘벡 주의회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이 나왔다. 퀘벡미래연합의 선거개혁안은 80명은 기존처럼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나 나머지 45명을 비례대표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는 초과연동을 제외하면 스코틀랜드, 웨일스 자치의회 선거방식과 비슷하다.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주 총선과 주민투표를 같이 치를 예정이었으나 일단은 무산되었다.#
다만, 퀘벡주의 정치는 영어권에 갇힌 북미 프랑스어의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성, 영미법계의 시스템에 강하게 남은 프랑스식 대륙법계의 흔적, 퀘벡 현대사를 상징하는 조용한 혁명과 분리주의, 진보·보수의 장대하고도 난잡(...)한 이합집산이 반복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어권 캐나다 정치판과 똑같이 바라봤다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이 많다.
일단 연방 선거에서는 대개 득표율이 8(진보):2(보수) 수준으로 진보 정당이 초강세인 경우가 많은데 비해, 주 선거에서는 그 정도까진 아니라 보수층이 단일화를 잘해서 기세를 탈시엔 득표율 기준 6(진보):4(보수) 수준까지 따라붙어 후술되어있듯 소선거구제의 이점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과연 퀘벡 진보세의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퀘벡 블록을 진보정당으로 대접하는게 옳은가(...) 하는 의문이다.[24]
지역적으로 따져보면, 서남부에 위치한 주 최대도시 몬트리올 광역권에서는 주로 캐나다 자유당이 강세이며, 몬트리올에서 동북부에 위치한 주도 퀘벡시와 그 광역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당 당선자도 꽤 나온다. 그 외 주로 덩치가 큰 교외 및 시골 선거구들은 퀘벡 블록이 강세를 이루는 편이다.
2011년 연방 총선때는 보수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퀘벡주에선 신민당과 퀘벡 블록의 득표율 합이 66%, 보수당은 16%를 득표했을 정도로 저조했다. 2011년 총선 당시 보수당이 66%를 득표했고 신민당은 16%를 득표한 앨버타주와는 정반대. 2019년 연방 총선에서도 총 의석 78석 중 자유당이 35석, 보수당이 10석, 퀘벡 블록이 32석, 신민당이 1석을 차지하며 진보 진영이 강세를 보였다. 득표율은 자유당 34.2%, 보수당 16%, 퀘벡 블록 32.5%, 신민당 10.7%, 녹색당 4.5%, 인민당 1.5%.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2010년대 자유당과 신민당에 지지 기반을 다 뺏기며 군소정당으로 몰락했던 퀘벡 지역 정당 퀘벡 블록이 부활했다는 점이 있다. 2021년 총선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주 선거의 경우 2018년 주 선거에서는 그동안 주의회를 장악해온 퀘벡 자유당과 퀘벡당이 무너졌다. 퀘벡미래연합이 의석수 기준 단독 과반을 채워 첫 집권에 성공했다. 다만 득표율 기준으론 37.42%밖에 득표하지 못해 여전히 진보 진영이 앞서긴 했다. 분열 효과를 톡톡히 본 셈. 한편, 이전엔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던 퀘벡연대[25]는 이 선거에서는 16%의 득표율을 얻으며, 기존 3석에서 10석으로 의석이 늘어나는 등 상당히 선전했다.
물론 보수 성향인 퀘벡미래연합도 프랑스어 보호를 위해 영어 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법을 제정하는 등# 퀘벡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민에 대해서도 상당히 빡빡하게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보수적인 농촌 지역에서는 주 선거에서는 퀘벡미래연합이 우세하고 연방 선거에서는 퀘벡 블록이 우세한 모습도 나타난다.
2020년 들어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퀘벡 주의회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이 나왔다. 퀘벡미래연합의 선거개혁안은 80명은 기존처럼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나 나머지 45명을 비례대표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는 초과연동을 제외하면 스코틀랜드, 웨일스 자치의회 선거방식과 비슷하다. 2021년에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주 총선과 주민투표를 같이 치를 예정이었으나 일단은 무산되었다.#
퀘벡주 하면 20세기만 해도 분리주의 운동으로 나름 유명했으나, 지금은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과는 달리 퀘벡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다수인 상황이다.
정치인들의 이중 언어 사용, 퀘벡의 프랑스어 사용 보장 및 퀘벡 주변 지역의 프랑스어 사용 장려 등으로 정치, 문화적인 배려, 중앙정부의 퀘벡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막대한 세금 지원등을 하고 있는 점도 한몫한다.#
정치인들의 이중 언어 사용, 퀘벡의 프랑스어 사용 보장 및 퀘벡 주변 지역의 프랑스어 사용 장려 등으로 정치, 문화적인 배려, 중앙정부의 퀘벡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막대한 세금 지원등을 하고 있는 점도 한몫한다.#
퀘벡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주로, 온타리오와 같이 캐나다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퀘벡 단독으로도 그리스나 노르웨이 전체의 경제 규모와 비슷하다. 퀘벡 전체의 경제는 서비스업 위주지만 농업 및 수산업, 임업, 광업, 제조업 역시 발달해있다.
몬트리올은 퀘벡의 경제 중심지로 금융, R&D, IT, 물류 산업, 보험 등 서비스업, 항공기, 철도차량, 제약 산업 등이 발달해 있다. 봄바디어, 롤스로이스 plc, 프랫&휘트니 등 항공기 관련 기업, 유비소프트, Microsoft, Bell Canada 등 IT 기업, 노바티스 등 제약 기업들의 본사나 지사도 몬트리올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에어캐나다의 본사 및 허브 공항인 몬트리올 피에르 엘리오트 트뤼도 국제공항과 캐나다의 주요 항만이자 세인트로렌스강 하구에 있는 몬트리올 항 역시 퀘벡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의 농산물[26] 등을 대서양 지역으로 수출하는 통관항 중 하나가 몬트리올이다.
퀘벡시에는 빅토리아와 비슷하게 주 정부의 청사가 있어, 주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인근 대학의 학생, 외국인 관광객에 주로 의존한다. 그리고 캐나다군의 주요 기지이자 캐나다 국왕과 총독의 거주지인 시타델이 있어 캐나다군의 수요 역시 많다. 최근에는 캐나다 정부나 퀘벡주 정부에서 퀘벡시에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티노 역시 오타와 생활권에 속하고 캐나다 정부 청사가 있어 공공 부분이 발달했다.
대서양과 접하고 있는 가스페반도 지역에는 농업, 임업과 수산업이 발달해있는데 주로 낙농업, 펄프용 목재 재제, 제지 산업, 연어, 바닷가재 어획 등이 발달해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의 경우 제재업, 광업 등이 발달했고, 알루미늄 제조업 및 천연자원 가공업 역시 발달했다.
몬트리올과 퀘벡 지역의 평원에서는 메이플 시럽 제작, 사과주, 사과, 배 재배 등 과수 농업, 원예농업, 치즈, 크림, 버터 제조 등 낙농업, 옥수수, 대두 재배 및 육우, 돼지 사육 등 혼합농업, 임업이 발달해있다. 특히 메이플 시럽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 중 퀘벡의 생산량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한데, 1901년 오타와에서 일하던 속기사 알퐁소 데자르뎅이 고리로 고통을 받던 서민들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생긴 데자르뎅 그룹(Desjardins Group)은 북미 최대의 신협이 되었다.
몬트리올은 퀘벡의 경제 중심지로 금융, R&D, IT, 물류 산업, 보험 등 서비스업, 항공기, 철도차량, 제약 산업 등이 발달해 있다. 봄바디어, 롤스로이스 plc, 프랫&휘트니 등 항공기 관련 기업, 유비소프트, Microsoft, Bell Canada 등 IT 기업, 노바티스 등 제약 기업들의 본사나 지사도 몬트리올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에어캐나다의 본사 및 허브 공항인 몬트리올 피에르 엘리오트 트뤼도 국제공항과 캐나다의 주요 항만이자 세인트로렌스강 하구에 있는 몬트리올 항 역시 퀘벡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의 농산물[26] 등을 대서양 지역으로 수출하는 통관항 중 하나가 몬트리올이다.
퀘벡시에는 빅토리아와 비슷하게 주 정부의 청사가 있어, 주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인근 대학의 학생, 외국인 관광객에 주로 의존한다. 그리고 캐나다군의 주요 기지이자 캐나다 국왕과 총독의 거주지인 시타델이 있어 캐나다군의 수요 역시 많다. 최근에는 캐나다 정부나 퀘벡주 정부에서 퀘벡시에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티노 역시 오타와 생활권에 속하고 캐나다 정부 청사가 있어 공공 부분이 발달했다.
대서양과 접하고 있는 가스페반도 지역에는 농업, 임업과 수산업이 발달해있는데 주로 낙농업, 펄프용 목재 재제, 제지 산업, 연어, 바닷가재 어획 등이 발달해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의 경우 제재업, 광업 등이 발달했고, 알루미늄 제조업 및 천연자원 가공업 역시 발달했다.
몬트리올과 퀘벡 지역의 평원에서는 메이플 시럽 제작, 사과주, 사과, 배 재배 등 과수 농업, 원예농업, 치즈, 크림, 버터 제조 등 낙농업, 옥수수, 대두 재배 및 육우, 돼지 사육 등 혼합농업, 임업이 발달해있다. 특히 메이플 시럽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 중 퀘벡의 생산량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한데, 1901년 오타와에서 일하던 속기사 알퐁소 데자르뎅이 고리로 고통을 받던 서민들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생긴 데자르뎅 그룹(Desjardins Group)은 북미 최대의 신협이 되었다.
퀘벡은 대체에너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대체에너지산업에 1980년대부터 투자해왔다. 덕분에 퀘벡의 총 대체에너지 생산량은 중국, 브라질, 미국 다음가는 4위이고, 퀘벡의 1년 전기생산량의 98%가 대체에너지에서 나오며#, 이 대체에너지의 절대다수는 바로 수력 발전에서 나온다. 특히 퀘벡의 수력발전을 논할 때엔 몬트리올과 퀘벡시티 같은 대도시 근처 생로랑강보다도 더 중요한 지역이 바로 사람 별로 없는 북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수자원이 풍부한 북극권 인접 산악·고원이라서 수력발전에 매우 적합하다.[27] 허드슨 만 방면으로 향하는 북부 타이가 지대의 큰 강[28]에 위치한 최대출력 5.6GW짜리 로베르 부라사 수력발전소(Aménagement Robert-Bourassa)[29], 여기에 더해 생로랑 만의 라 로멘느 발전소(Aménagement hydroélectrique de la Romaine)도 최대 출력이 1.5GW에 달한다. 참고로 온타리오가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SMR의 출력이 수백'메가와트'급인데 퀘벡은 그것의 수십배를 수력발전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쯤되면 옆동네 온타리오주의 어지간한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비교해도 딱히 밀리지 않는 수준이다. 남들과는 다른 의미의 방장사기맵
그래서 퀘벡은 서부의 앨버타를 비롯해 산유지, 정유 업계가 원하던 대서양 방면 파이프라인 건설을 극구 거부[30][31]하고 민간의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가솔린, 디젤에 관해 높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정치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32]
전기자동차 보급률 상승에도 매우 적극적이라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캐나다 전국 최고액인 8천달러를 뿌린다. 퀘벡의 EV보조금과 연방의 EV보조금을 합하면 약 13,000달러에 달하는 거액이 리베이트로 보조되기 때문에 기후가 상당히 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33]
그리고 몬트리올과 같은 대도시 외에도 중소도시나 시골 지역에서도 전기자동차가 자주 보일 정도이며 퀘벡주 정부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나 여러 혜택을 부여하면서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퀘벡에 등록된 차량 중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10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자동차 외에도 수소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토요타 최초의 상용화 수소차인 토요타 미라이를 퀘벡 에너지부의 예산으로 50대 구매하는 등 수소에너지에도 가장 먼저 개척을 나서고 있다.
만약 세계 시장에서 수소자동차의 판매와 보급이 상업적 성공을 거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현대 넥쏘와 같은 수소차 모델도 있으니 현대자동차그룹에게도 호의적인 시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여태까지의 퀘벡주 에너지부의 정책적 성향을 고려해 볼때 수소자동차 시장의 상업성과 규모의 경제만 뒷받침되면 퀘벡 주정부에서 수소자동차에도 막대한 구입보조금 예산을 책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자력 발전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이라 일찌감치 유일하게 남아있던 베캉쿠르(Bécancour)의 장티이(Gentilly) 원전을 2012년에 폐쇄하고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야 수력 자원이 온타리오에 비해 엄청나게 풍부해 굳이 원전까지 돌릴 이유가 없기 때문. 실제로도 퀘벡의 전기생산량은 인구가 더 많고 제조업 단지의 전력수요도 막대한 온타리오의 발전량보다도 많다. 이웃인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토론토 광역권(GTA)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34]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방장사기맵이라는 감탄이 나올 지경.
그래서 퀘벡은 서부의 앨버타를 비롯해 산유지, 정유 업계가 원하던 대서양 방면 파이프라인 건설을 극구 거부[30][31]하고 민간의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가솔린, 디젤에 관해 높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정치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32]
전기자동차 보급률 상승에도 매우 적극적이라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캐나다 전국 최고액인 8천달러를 뿌린다. 퀘벡의 EV보조금과 연방의 EV보조금을 합하면 약 13,000달러에 달하는 거액이 리베이트로 보조되기 때문에 기후가 상당히 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33]
그리고 몬트리올과 같은 대도시 외에도 중소도시나 시골 지역에서도 전기자동차가 자주 보일 정도이며 퀘벡주 정부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나 여러 혜택을 부여하면서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퀘벡에 등록된 차량 중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10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자동차 외에도 수소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토요타 최초의 상용화 수소차인 토요타 미라이를 퀘벡 에너지부의 예산으로 50대 구매하는 등 수소에너지에도 가장 먼저 개척을 나서고 있다.
만약 세계 시장에서 수소자동차의 판매와 보급이 상업적 성공을 거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현대 넥쏘와 같은 수소차 모델도 있으니 현대자동차그룹에게도 호의적인 시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여태까지의 퀘벡주 에너지부의 정책적 성향을 고려해 볼때 수소자동차 시장의 상업성과 규모의 경제만 뒷받침되면 퀘벡 주정부에서 수소자동차에도 막대한 구입보조금 예산을 책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자력 발전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이라 일찌감치 유일하게 남아있던 베캉쿠르(Bécancour)의 장티이(Gentilly) 원전을 2012년에 폐쇄하고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야 수력 자원이 온타리오에 비해 엄청나게 풍부해 굳이 원전까지 돌릴 이유가 없기 때문. 실제로도 퀘벡의 전기생산량은 인구가 더 많고 제조업 단지의 전력수요도 막대한 온타리오의 발전량보다도 많다. 이웃인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토론토 광역권(GTA)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34]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방장사기맵이라는 감탄이 나올 지경.
언어 외에 퀘벡이 가진 또 하나의 독특한 요소는 가톨릭이다. 종교적 다양성과 세속화가 가속화되는 현재로서야 지금은 그 특징이 많이 약해졌지만, 퀘벡은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앙시앵 레짐이 한참이던 프랑스 왕국에서 떨어져 나왔고, 서구 사회에서는 근대화가 상당히 늦은 편이어서 20세기 중반까지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삶의 전반에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던 곳이었다. 지리적으로도 개신교 세력이 지배적이었던 미국과 영국령 캐나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35] 가톨릭이라는 점은 퀘벡의 정체성 중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전체 인구의 30~40% 가량이 가톨릭 신자인데, 이들 중 대부분이 퀘벡인들이거나 퀘벡 밖 프랑코폰들이다.[36] 퀘벡은 조용한 혁명을 계기로 급격한 세속화가 진행되어[37] 신자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수치조차도 인구의 절반이 가톨릭인 수준이니 결국 이러니저러니 해도 가톨릭의 우위는 여전한 셈이다.
퀘벡의 지도를 놓고 보면 생트푸아, 생트마리, 생장, 생모리스 등 생(Saint)이나 생트(Sainte)로 시작하는 지명이나 거리 이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톨릭 성인(聖人)의 이름에 의탁함으로서 거친 퀘벡을 개척해 나가려 했던 과거 이주민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 지명은 대개 프랑스어권에서 지명 및 인명으로 원래 널리 쓰이던 성인명이지만 북미 식민지 개척 초창기에 순교한 예수회 선교사들, 또는 퀘벡의 옛 고위성직자 인명을 따왔다. 의외로 한국인들도 천주교 신자라면 자주 들어봤을법한 친숙한 이름도 있다. 쇼지에르아플레슈 현의 미국 국경 근처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인데, 동네 이름이 생 쥐스트 드 브르트니에르(Saint-Just-de-Bretenières)이다. 바로 조선에서 병인박해 때 순교하고 1984년 시성된 프랑스인 신부이다. 원래는 순교자 유스티누스를 기념하면서 Saint-Juste라는 스펠링으로 동네 이름을 붙이며 그 뒤에 부르고뉴 귀족 가문의 이름을 붙인 동네였는데, 그 가문에서 배출된 같은 세례명의 신부가 순교하고 1984년 시성되자 아예 1987년에 순교성인의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붙여버린 것이다.
퀘벡의 최대 공휴일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축일인 6월 24일이다. 퀘벡주에서는 수호성인이라는 점도 있거니와 해당 축일이 바로 한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 퀘벡인들에겐 더욱 각별하다. 비록 1960년대 퀘벡의 현대화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 감소와 세속화로 말미암아 이 날의 공식명칭은 민족의 축제(La Fête Nationale)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세례자 요한 축일이라고 널리 불리고 있다. 캐나다 국경일에도 쉬긴 하는데 이들에게는 그냥 쉬는 날일 뿐, 이 날에 이사 등을 한다.
2010년 10월 17일, 앙드레 베세트(André Bessette) 성십자가회(Congrégation de Sainte-Croix) 수사가 '몬트리올의 성 안드레아'로 시성되었다. 2012년에는 북미 지역 원주민 및 가톨릭 단체들의 시성 운동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선교와 자연보호에 헌신한 '동정 성녀 카테리 테카퀴타(Kateri Tekakwitha)'가 시성되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으로는 최초의 시성 사례이다. 그리고 2014년에는 프랑수아-그자비에 드 몽모랑시-라발(Francis-Xavier de Montmorency-Laval), 일반인들에겐 라발 대학교의 교명으로 유명한 초대 퀘벡대교구장 라발 주교가 시성되었다. 또한 캐나다에는 순교성인들도 여럿 있는데, 대개 16세기 누벨프랑스 개척 초창기에 오대호 주변지역에서 선교활동 중 원주민들과의 교전에 휘말려 순교한 프랑스 출신 예수회 선교사들이다. 원주민들에게 도끼로 참수당하거나 화형당하거나 잡아먹히는 등 하나같이 험하게 순교했는데, 시복·시성된 선교사들 중 일부는 오늘날의 미국 영토에서 순교하기도 했지만 그냥 다 같이 '캐나다의 순교자'로 함께 시성되었다. 이들은 누벨프랑스 역사의 초창기를 장식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가톨릭 우위 지역인 퀘벡주에는 주요 도시마다 이들 선교사들의 이름을 딴 학교[38]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이 많다.
퀘벡도 프랑스처럼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라이시테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을 비롯한 퀘벡주 소속의 공무원들은 근무중에 히잡, 터번, 십자가 등을 비롯한 종교적 색체가 드러나는 복장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젊은 세대로 올수록 심하다는 가톨릭에 대한 반감도 어디까지나 '세속화'라는 제한된 맥락에서의 반감에 가까운 편. 캐나다에서는 21세기 들어 레지덴셜 스쿨이라는 흑역사가 까발려지며 그 주도세력이었던 가톨릭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는 추세인데, 의외로 캐나다에서 가장 독실한 가톨릭 중심 문화권이라는 퀘벡주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반발 여론이 타지에서만큼 강하지는 않은 편이다. 근본적으로 레지덴셜 스쿨은 동부에 비해 개발이 늦었던 영어권 중심 옛 루퍼츠랜드 지역의 이슈이기도 하고, 가톨릭이 퀘벡의 언어와 문화를 지금까지 이어오는데에 기여한 바도 상당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단에 대한 시선은 영어권의 반발에 비해 복잡미묘한 편이다.[39] 말하자면 '신앙으로서의 가톨릭'과 '문화로서의 가톨릭' 중 전자는 쇠퇴했지만 후자는 남아있다 할 수 있다.[40]
퀘벡의 지도를 놓고 보면 생트푸아, 생트마리, 생장, 생모리스 등 생(Saint)이나 생트(Sainte)로 시작하는 지명이나 거리 이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톨릭 성인(聖人)의 이름에 의탁함으로서 거친 퀘벡을 개척해 나가려 했던 과거 이주민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 지명은 대개 프랑스어권에서 지명 및 인명으로 원래 널리 쓰이던 성인명이지만 북미 식민지 개척 초창기에 순교한 예수회 선교사들, 또는 퀘벡의 옛 고위성직자 인명을 따왔다. 의외로 한국인들도 천주교 신자라면 자주 들어봤을법한 친숙한 이름도 있다. 쇼지에르아플레슈 현의 미국 국경 근처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인데, 동네 이름이 생 쥐스트 드 브르트니에르(Saint-Just-de-Bretenières)이다. 바로 조선에서 병인박해 때 순교하고 1984년 시성된 프랑스인 신부이다. 원래는 순교자 유스티누스를 기념하면서 Saint-Juste라는 스펠링으로 동네 이름을 붙이며 그 뒤에 부르고뉴 귀족 가문의 이름을 붙인 동네였는데, 그 가문에서 배출된 같은 세례명의 신부가 순교하고 1984년 시성되자 아예 1987년에 순교성인의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붙여버린 것이다.
퀘벡의 최대 공휴일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축일인 6월 24일이다. 퀘벡주에서는 수호성인이라는 점도 있거니와 해당 축일이 바로 한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 퀘벡인들에겐 더욱 각별하다. 비록 1960년대 퀘벡의 현대화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 감소와 세속화로 말미암아 이 날의 공식명칭은 민족의 축제(La Fête Nationale)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세례자 요한 축일이라고 널리 불리고 있다. 캐나다 국경일에도 쉬긴 하는데 이들에게는 그냥 쉬는 날일 뿐, 이 날에 이사 등을 한다.
2010년 10월 17일, 앙드레 베세트(André Bessette) 성십자가회(Congrégation de Sainte-Croix) 수사가 '몬트리올의 성 안드레아'로 시성되었다. 2012년에는 북미 지역 원주민 및 가톨릭 단체들의 시성 운동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선교와 자연보호에 헌신한 '동정 성녀 카테리 테카퀴타(Kateri Tekakwitha)'가 시성되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으로는 최초의 시성 사례이다. 그리고 2014년에는 프랑수아-그자비에 드 몽모랑시-라발(Francis-Xavier de Montmorency-Laval), 일반인들에겐 라발 대학교의 교명으로 유명한 초대 퀘벡대교구장 라발 주교가 시성되었다. 또한 캐나다에는 순교성인들도 여럿 있는데, 대개 16세기 누벨프랑스 개척 초창기에 오대호 주변지역에서 선교활동 중 원주민들과의 교전에 휘말려 순교한 프랑스 출신 예수회 선교사들이다. 원주민들에게 도끼로 참수당하거나 화형당하거나 잡아먹히는 등 하나같이 험하게 순교했는데, 시복·시성된 선교사들 중 일부는 오늘날의 미국 영토에서 순교하기도 했지만 그냥 다 같이 '캐나다의 순교자'로 함께 시성되었다. 이들은 누벨프랑스 역사의 초창기를 장식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가톨릭 우위 지역인 퀘벡주에는 주요 도시마다 이들 선교사들의 이름을 딴 학교[38]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이 많다.
퀘벡도 프랑스처럼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라이시테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을 비롯한 퀘벡주 소속의 공무원들은 근무중에 히잡, 터번, 십자가 등을 비롯한 종교적 색체가 드러나는 복장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젊은 세대로 올수록 심하다는 가톨릭에 대한 반감도 어디까지나 '세속화'라는 제한된 맥락에서의 반감에 가까운 편. 캐나다에서는 21세기 들어 레지덴셜 스쿨이라는 흑역사가 까발려지며 그 주도세력이었던 가톨릭에 대한 반감이 강해지는 추세인데, 의외로 캐나다에서 가장 독실한 가톨릭 중심 문화권이라는 퀘벡주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반발 여론이 타지에서만큼 강하지는 않은 편이다. 근본적으로 레지덴셜 스쿨은 동부에 비해 개발이 늦었던 영어권 중심 옛 루퍼츠랜드 지역의 이슈이기도 하고, 가톨릭이 퀘벡의 언어와 문화를 지금까지 이어오는데에 기여한 바도 상당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단에 대한 시선은 영어권의 반발에 비해 복잡미묘한 편이다.[39] 말하자면 '신앙으로서의 가톨릭'과 '문화로서의 가톨릭' 중 전자는 쇠퇴했지만 후자는 남아있다 할 수 있다.[40]
퀘벡의 독자적인 식문화라 부를 만한 문화는 없다고 봐도 좋다. 프랑스 요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게트나 포도주, 치즈 등이 더 많이 소비되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기름지거나 단 음식, 육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메이플 시럽(Sirop d'érable)의 최다 생산지이기도 하다. 다만 음주 규제는 프랑스보다 훨씬 강력해, 주류는 거의 대부분이 주영기업인 SAQ에서 판매되지만 그래도 온타리오의 LCBO, 브리티시컬럼비아의 BC Liquor, 밑동네 유타주보다는 최소한 관대한 편.
프랑스어권임에도 캐나다 타 지역처럼 영미권 특유의 투박하면서 기름진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아침식사부터 계란에 베이컨을 곁들이는 등 영어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프랑스 본토의 아침식사가 크루아상이나 초코빵에 커피로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푸틴(Poutine). 1950년대 퀘벡의 농촌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감자튀김에 치즈커드와 그레이비 소스를 끼얹은 단순한 음식. 맥도날드에서도 맥푸틴(푸틴)을 팔 정도로 인기가 있다. 맛은 그레이비의 질에 따라서 천차만별. 물론 칼로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대개 1,400~2,000 kcal정도다.


빵 사이에 훈제한 고기만 잔뜩 끼운 몬트리올 스타일 스모크드 미트 샌드위치. 위 사진은 Schwartz's Deli 라는 몬트리올에서 가장 오래된 80년 된 가게의 사진이다.


성탄절에 주로 먹는 고기파이 투르티에르(Tourtière)


디저트로 먹는 설탕 파이(Tarte au sucre)
특이하게 거위보다는 오리 푸아그라를 사용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고열량 음식들이 많고 디저트를 즐겨먹지만 캐나다 전체에서 비만률이 제일 낮은 주로 뽑혔다.#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나, 오늘날과 같은 땅콩버터를 처음 고안하고 특허를 받은 사람은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살던 마셀러스 에드슨 (Marcellus Gilmore Edson)이다.
프랑스어권임에도 캐나다 타 지역처럼 영미권 특유의 투박하면서 기름진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아침식사부터 계란에 베이컨을 곁들이는 등 영어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프랑스 본토의 아침식사가 크루아상이나 초코빵에 커피로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푸틴(Poutine). 1950년대 퀘벡의 농촌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감자튀김에 치즈커드와 그레이비 소스를 끼얹은 단순한 음식. 맥도날드에서도 맥푸틴(푸틴)을 팔 정도로 인기가 있다. 맛은 그레이비의 질에 따라서 천차만별. 물론 칼로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대개 1,400~2,000 kcal정도다.

빵 사이에 훈제한 고기만 잔뜩 끼운 몬트리올 스타일 스모크드 미트 샌드위치. 위 사진은 Schwartz's Deli 라는 몬트리올에서 가장 오래된 80년 된 가게의 사진이다.

성탄절에 주로 먹는 고기파이 투르티에르(Tourtière)

디저트로 먹는 설탕 파이(Tarte au sucre)
특이하게 거위보다는 오리 푸아그라를 사용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고열량 음식들이 많고 디저트를 즐겨먹지만 캐나다 전체에서 비만률이 제일 낮은 주로 뽑혔다.#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나, 오늘날과 같은 땅콩버터를 처음 고안하고 특허를 받은 사람은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살던 마셀러스 에드슨 (Marcellus Gilmore Edson)이다.
퀘벡주와 몬트리올은 불어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인들에게 캐나다 이민 시 기피 1순위로 꼽힌다. 예전 퀘벡에서 영주권 따기가 쉬웠던 시절에도 퀘벡에서 영주권만 따고 한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온타리오, 앨버타 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도망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게 캐나다 이민제도 중 주에서 시행하는 이민프로그램의 맹점이기도 하다. 인구가 없는 깡촌 주에서 인구를 늘려보려고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면[41] 그 주에서 영주권을 딴 후 뒤도 안돌아보고 인기 있는 주로 도망가기 때문이다. 일단 영주권을 따면 캐나다 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수는 없으니...
2018년 퀘벡미래연합 집권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퀘벡 이민정책이 유연해서 불어를 전혀 못하는 경우에도 이공계인력 등 핵심인력은 영주권을 받는 이민 프로그램도 있었고그렇게 영주권 받고 다 다른 주로 튀었다, 불어 능력 증명도 공인 시험이 아닌 다른 방법이 가능했으므로 실질적인 불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2018년 집권한 퀘벡미래연합의 프랑수아 르고 정부는 2019년 Loi 9(법안 9호)을 통과시켜 16,000건의 이민 신청서를 취소시켰다.#
2020년에는 이민법이 다시 개정되어 한국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프랑스어권 출신, 비-라틴어권 출신의 외국인들은 이전보다 이민을 하기 많이 어려워졌다. 프랑스어 구사 여부에 대해 더 까다롭게 따진다.#
2025년 11월 퀘벡 주정부가 PEQ (Programme de l'expérience québécoise, 퀘벡경험프로그램)를 영구 폐지했다. PEQ는 한때 유학생이나 임시 근로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인기 있는 경로[42]였으나, 현재 집권여당 퀘벡미래연합이 반이민, 반외국인 정책을 펴면서 퀘벡 주정부는 이를 영구 폐지하기로 했다. 퀘벡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PSTQ(Programme de sélection des travailleurs qualifiés du Québec) 시스템에서는 퀘벡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직업군만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동안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였던 PEQ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아직도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퀘벡을 통한 영주권 취득 보다는 다른 주도 알아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다. 비단 퀘벡 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체가 이민에 대한 문을 닫고 있다. 퀘벡 영주권 준비하겠다고 한국에서 재산 다 처분하고 퀘벡으로 넘어왔는데 법이 바껴서 X된 사람들도 봤다
일단 퀘벡에 왔다면, 퀘벡의 이민, 프랑스어 교육 및 통합부 (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a Francisation et de l'Intégration, MIFI)에서 외국인에 대한 불어 교육을 관광객이나 방문자 비자를 제외한, 퀘벡에 거주중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교사들의 질은 케바케다. 모두 퀘벡 정부 불어교사 풀에 등록된 사람들인데, 대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올 때도 있고, 고등학교 불어선생님이 올 때도 있는 반면 불어권에서 이민온 우버기사(…)가 걸릴때도 있다. 정부 불어 프로그램도 이민자의 증가로 교사를 증원하다 보니 별의 별 인간 군상이 다 들어와 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빡세게 시키는 선생이 있는 반면, 시간만 때우고 학생들에게 자습하라고 한 다음 농뗑이치는 비양심적인 선생도 있다.
지난 몇년간 퀘벡에 이민자가 몰려와서 신청자가 많다. 주정부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등록을 하면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민자용 불어 교육기관으로 배정해 주는데, 대기가 많이 밀려 있어 최소 6개월~최대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코스가 제공된다.
예전에는 놀랍게도 수강자에게 불어공부하느라 고생한다고 돈도 줬다! 그런데 퀘벡 정부 곳간이 텅텅 비어가서 2024년 하반기 부터 파트타임 수강하는 학생에게는 돈 지급을 중지했다. 풀타임 수강생에게는 아직 돈을 주는데, 퀘벡 재정이 파탄나서 2024년 신용등급 강등까지 된 상황이라 이것도 언제 끊길지 모른다.
2021년 당시 캐나다 통계청 인구 조사에서는 퀘벡주 거주 한인의 수는 약 6천에서 7천 사이로 조사되었다. 이는 애들 데리고 온 유학생 엄마들 등 임시 거주자는 반영되지 않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숫자이다. 추산에 따르면 임시 거주자까지 합치면 몬트리올 광역권에 약 2만명 정도의 한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퀘벡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불어우선/영어탄압정책[43]으로 인해 많은 한인이 퀘벡을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예전에는 퀘벡주, 특히 몬트리올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사설 어학원에서 풀타임 어학연수 과정을 등록하면 자녀들이 수에 관계없이 최대 2년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도 폐지되어서 한국 엄마들도 퀘벡에 더이상 올 이유가 없는듯 하다. [44]
퀘벡에선 아프리카 출신 흑인, 아랍계 사람들과 남미 출신의 사람들을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접촉할 수 있다. 라틴어권의 언어들[45]은 기본적으로 문법을 포함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라틴어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고 쉽게 프랑스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과 관련된 기타 전문용어의 경우, 읽는 방법만 다를 뿐, 알파벳은 99% 똑같은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랍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랍어의 명사들이 프랑스어와 겹치는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프랑스어 단어를 아랍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북아프리카의 주 종교는 이슬람이며, 프랑스의 식민지를 장기간 받은 기조가 오늘날까지 살아있어, 마치 한국인들이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처럼, 북아프리카 출신 아랍인들도 쉽게 프랑스어를 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신대륙답게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이민 유입 인구가 많다. 다만 이민 유입은 주로 대도시인 몬트리올, 퀘벡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퀘벡주 전체를 놓고 보자면 다른 주에 비해 언어의 어려움으로 이민 인구 비율은 꽤나 낮다. 특히 교외나 시골로 가면 신대륙답지 않게 거의 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상당히 동질적인 인구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흔히 퀘벡 사람들은 몬트리올이 '국제적인 도시'라는 인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몬트리올이 북미의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더 국제적이거나 다채로워서 그렇다기보다는 퀘벡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퀘벡 본토인들에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하여튼 이민 인구 덕분에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서서히나마 증가하는 중. 2025년에 약 900만까지 증가하였다.
주로 이민을 받는 나라는 프랑스어가 널리 쓰이는 나라인 모로코, 알제리, 레바논, 튀니지, 그리고 프랑스이다. 왠지 프랑스인들에게는 '프랑스보다 덜 시끄럽고 더 느긋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월급은 두 배나 높은 곳'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듯. 유학도 많이 오는데 몬트리올 대학교를 보면 특히 상경, 이공계의 경우 전체 학생의 30% 가량이 프랑스 국적 학생들로 채워져서 교육 당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상경은 HEC 몬트리올, 이공계는 에콜 폴리테크닉인데 심지어 이 두 단과대는 그랑제콜 협회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협정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프랑스 국적의 학생들도 퀘벡 주민들과 같은 학비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전국에서 500명만 입학 가능한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낙방한 학생들의 경우 다른 그랑제콜이나 일반 대학으로 진학하기보다는 몬트리올 대학 진학을 노리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공동 학위 과정이 있기도 하고, 영어가 주류인 북미에서 유학했다는 자체가 학벌을 중요시하는 프랑스 내에서는 큰 메리트이기 때문. 결국 2015년 이후 퀘벡주로 유학 온 프랑스인 학생들도 퀘벡 주민들이 내야 하는 등록금의 3배를 내야 하지만, 여전히 캐나다 국적이 없는 외국인들이 내야 하는 등록금의 반값이라 원성을 사는 중이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46] 등 타 지역으로 가는 케이스도 많다.#[47]
2018년 퀘벡미래연합 집권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퀘벡 이민정책이 유연해서 불어를 전혀 못하는 경우에도 이공계인력 등 핵심인력은 영주권을 받는 이민 프로그램도 있었고
2020년에는 이민법이 다시 개정되어 한국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프랑스어권 출신, 비-라틴어권 출신의 외국인들은 이전보다 이민을 하기 많이 어려워졌다. 프랑스어 구사 여부에 대해 더 까다롭게 따진다.#
2025년 11월 퀘벡 주정부가 PEQ (Programme de l'expérience québécoise, 퀘벡경험프로그램)를 영구 폐지했다. PEQ는 한때 유학생이나 임시 근로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인기 있는 경로[42]였으나, 현재 집권여당 퀘벡미래연합이 반이민, 반외국인 정책을 펴면서 퀘벡 주정부는 이를 영구 폐지하기로 했다. 퀘벡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PSTQ(Programme de sélection des travailleurs qualifiés du Québec) 시스템에서는 퀘벡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직업군만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동안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였던 PEQ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아직도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퀘벡을 통한 영주권 취득 보다는 다른 주도 알아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다. 비단 퀘벡 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체가 이민에 대한 문을 닫고 있다.
일단 퀘벡에 왔다면, 퀘벡의 이민, 프랑스어 교육 및 통합부 (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a Francisation et de l'Intégration, MIFI)에서 외국인에 대한 불어 교육을 관광객이나 방문자 비자를 제외한, 퀘벡에 거주중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교사들의 질은 케바케다. 모두 퀘벡 정부 불어교사 풀에 등록된 사람들인데, 대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올 때도 있고, 고등학교 불어선생님이 올 때도 있는 반면 불어권에서 이민온 우버기사(…)가 걸릴때도 있다. 정부 불어 프로그램도 이민자의 증가로 교사를 증원하다 보니 별의 별 인간 군상이 다 들어와 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빡세게 시키는 선생이 있는 반면, 시간만 때우고 학생들에게 자습하라고 한 다음 농뗑이치는 비양심적인 선생도 있다.
지난 몇년간 퀘벡에 이민자가 몰려와서 신청자가 많다. 주정부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등록을 하면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민자용 불어 교육기관으로 배정해 주는데, 대기가 많이 밀려 있어 최소 6개월~최대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코스가 제공된다.
예전에는 놀랍게도 수강자에게 불어공부하느라 고생한다고 돈도 줬다! 그런데 퀘벡 정부 곳간이 텅텅 비어가서 2024년 하반기 부터 파트타임 수강하는 학생에게는 돈 지급을 중지했다. 풀타임 수강생에게는 아직 돈을 주는데, 퀘벡 재정이 파탄나서 2024년 신용등급 강등까지 된 상황이라 이것도 언제 끊길지 모른다.
2021년 당시 캐나다 통계청 인구 조사에서는 퀘벡주 거주 한인의 수는 약 6천에서 7천 사이로 조사되었다. 이는 애들 데리고 온 유학생 엄마들 등 임시 거주자는 반영되지 않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숫자이다. 추산에 따르면 임시 거주자까지 합치면 몬트리올 광역권에 약 2만명 정도의 한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퀘벡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불어우선/영어탄압정책[43]으로 인해 많은 한인이 퀘벡을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예전에는 퀘벡주, 특히 몬트리올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사설 어학원에서 풀타임 어학연수 과정을 등록하면 자녀들이 수에 관계없이 최대 2년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도 폐지되어서 한국 엄마들도 퀘벡에 더이상 올 이유가 없는듯 하다. [44]
퀘벡에선 아프리카 출신 흑인, 아랍계 사람들과 남미 출신의 사람들을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접촉할 수 있다. 라틴어권의 언어들[45]은 기본적으로 문법을 포함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라틴어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고 쉽게 프랑스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과 관련된 기타 전문용어의 경우, 읽는 방법만 다를 뿐, 알파벳은 99% 똑같은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랍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랍어의 명사들이 프랑스어와 겹치는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프랑스어 단어를 아랍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북아프리카의 주 종교는 이슬람이며, 프랑스의 식민지를 장기간 받은 기조가 오늘날까지 살아있어, 마치 한국인들이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처럼, 북아프리카 출신 아랍인들도 쉽게 프랑스어를 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신대륙답게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이민 유입 인구가 많다. 다만 이민 유입은 주로 대도시인 몬트리올, 퀘벡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퀘벡주 전체를 놓고 보자면 다른 주에 비해 언어의 어려움으로 이민 인구 비율은 꽤나 낮다. 특히 교외나 시골로 가면 신대륙답지 않게 거의 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상당히 동질적인 인구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흔히 퀘벡 사람들은 몬트리올이 '국제적인 도시'라는 인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몬트리올이 북미의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더 국제적이거나 다채로워서 그렇다기보다는 퀘벡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퀘벡 본토인들에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하여튼 이민 인구 덕분에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서서히나마 증가하는 중. 2025년에 약 900만까지 증가하였다.
주로 이민을 받는 나라는 프랑스어가 널리 쓰이는 나라인 모로코, 알제리, 레바논, 튀니지, 그리고 프랑스이다. 왠지 프랑스인들에게는 '프랑스보다 덜 시끄럽고 더 느긋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월급은 두 배나 높은 곳'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듯. 유학도 많이 오는데 몬트리올 대학교를 보면 특히 상경, 이공계의 경우 전체 학생의 30% 가량이 프랑스 국적 학생들로 채워져서 교육 당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상경은 HEC 몬트리올, 이공계는 에콜 폴리테크닉인데 심지어 이 두 단과대는 그랑제콜 협회에도 가입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협정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프랑스 국적의 학생들도 퀘벡 주민들과 같은 학비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전국에서 500명만 입학 가능한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낙방한 학생들의 경우 다른 그랑제콜이나 일반 대학으로 진학하기보다는 몬트리올 대학 진학을 노리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공동 학위 과정이 있기도 하고, 영어가 주류인 북미에서 유학했다는 자체가 학벌을 중요시하는 프랑스 내에서는 큰 메리트이기 때문. 결국 2015년 이후 퀘벡주로 유학 온 프랑스인 학생들도 퀘벡 주민들이 내야 하는 등록금의 3배를 내야 하지만, 여전히 캐나다 국적이 없는 외국인들이 내야 하는 등록금의 반값이라 원성을 사는 중이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46] 등 타 지역으로 가는 케이스도 많다.#[47]
캐나다의 묻지마 아이스하키 사랑은 기본이고, 주의 최고 인기팀은 카나디앵 드 몽레알이다. 현지 사람들은 대부분 별명인 햅스(Les Habitants을 줄인 말)로 부른다. 또한 주도 퀘벡시에 한때 노르디크 드 케베크이라는 NHL 팀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퀘벡 시를 떠나 콜로라도 애벌랜치가 되었다. 그 중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어권 지역이라 선수수급과 관중동원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였다는 카더라가 있다.[48]
또한, 아이스하키계에서 유독 뛰어난 골텐더를 많이 배출하는 주가 퀘벡주이다. NHL 역사상 최고의 골텐더로 평가받는 햅스 레전드 파트리크 루아(Patrick Roy), 뉴저지 데블스의 NHL 통산 최다승, 최다경기, 최다완봉 기록 보유자 마르탱 브로되르(Martin Brodeur),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등 오랜 기간 밴쿠버 커넉스와 캐나다 국가대표의 뒷문을 지킨 레전드 로베르토 루옹고(Robert Luongo) 등 퀘벡 출신 골리들의 NHL에서의 활약상은 다른 주나 다른 국가를 압도한다. 이는 파트리크 루아를 통해 완성된 이른바 퀘벡 버터플라이라는 하나의 골텐더 수비 방식으로 전승될 정도.
몬트리올의 경우는 퀘벡주 최대 도시고 빅 마켓이라 MLB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존재했다. 하지만 2004년 재정문제로 팀이 매각되어 미국으로 팔려가 워싱턴 내셔널스가 되었다. 엑스포스가 떠난 이후 햅스 외의 미국 4대 스포츠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외에는 MLS의 앵팍트 드 몽레알, CFL의 몬트리올 알루에츠가 있다.
또한 1976 몬트리올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으나, 재정부담으로 올림픽 개최 후유증을 크게 겪기도 했다.
또한, 아이스하키계에서 유독 뛰어난 골텐더를 많이 배출하는 주가 퀘벡주이다. NHL 역사상 최고의 골텐더로 평가받는 햅스 레전드 파트리크 루아(Patrick Roy), 뉴저지 데블스의 NHL 통산 최다승, 최다경기, 최다완봉 기록 보유자 마르탱 브로되르(Martin Brodeur),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등 오랜 기간 밴쿠버 커넉스와 캐나다 국가대표의 뒷문을 지킨 레전드 로베르토 루옹고(Robert Luongo) 등 퀘벡 출신 골리들의 NHL에서의 활약상은 다른 주나 다른 국가를 압도한다. 이는 파트리크 루아를 통해 완성된 이른바 퀘벡 버터플라이라는 하나의 골텐더 수비 방식으로 전승될 정도.
몬트리올의 경우는 퀘벡주 최대 도시고 빅 마켓이라 MLB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존재했다. 하지만 2004년 재정문제로 팀이 매각되어 미국으로 팔려가 워싱턴 내셔널스가 되었다. 엑스포스가 떠난 이후 햅스 외의 미국 4대 스포츠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외에는 MLS의 앵팍트 드 몽레알, CFL의 몬트리올 알루에츠가 있다.
또한 1976 몬트리올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으나, 재정부담으로 올림픽 개최 후유증을 크게 겪기도 했다.
퀘벡이 낳은 몇 안 되는 세계적인 스타. 소위 세계 3대 디바이자 한국에선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로 유명하다. 당연히 한국에선 팝송 가수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퀘벡 및 프랑스어권에선 프랑스어로 노래한다. 물론 이외 지역에서는 영어로 노래를 부르며, 실제 영어 실력도 유창하다. 그래서인지 퀘벡인인지 아는 사람도 드물며, '디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북미에서의 활동 못지않게 프랑스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며 인기가 좋다. 그래서인지 프랑스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셀린 디옹이 말하는 퀘벡 프랑스어가 프랑스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양으로,[50] 종종 프랑스 코미디언들에게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레진 사샤뉴
뉴에이지 작곡가. 첫날처럼(Comme au premier jour), 조용한 날들(Les Jours Tranquilles), 바다 위의 피아노(Un Piano Sur La Mer) 등으로 유명하다. 이쪽은 왠지 프랑스인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마찬가지로 뉴에이지 음악가로 레바논 이민자 2세 출신이다. 다만 이름은 영어식인 것이 아이러니하다.
- 심플 플랜의 멤버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슈퍼 비르투오소로 테크닉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피아니스트이며, Circus Galop의 작곡가이기도 하다. 2017년 소곡집을 출판할 때 '우리 퀘벡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영어 및 프랑스어 모두 구사할 수 있어 퀘벡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갖고 있지만, 정작 1980년부터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닌 이후로 줄곧 미국에 살고 있다(...).[51]
- 프랭크 밀스(Frank Mills)
캐나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몬트리올 쁘띠 부르고뉴 출신이다.
- 이자벨 불레이
여성 가수로 Un jour ou l'autre(언젠가는) 라는 노래가 유명하다.
- 맨 아이 트러스트(Men I Trust)
2014년,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결성된 3인조 인디밴드이다. 구성원인 Jessy Caron, Dragos Chiriac, Emma Proulx 세 명 모두가 퀘벡 출신이다. 2019년 발매한 정규음반 'Oncle Jazz'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마니아층이 꽤나 생겼으며,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3년 총 3차례 내한하기도 했다.
- 갓스피드 유! 블랙 엠퍼러(Godspeed You! Black Emperor)
동계 올림픽에서 강세를 보이는 캐나다에서도 빙상 종목에서 특히 네임드 선수들 상당수가 퀘벡 출신이다.
* 마리안 생젤레: 前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 마크 가뇽: 前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 샤를 아믈랭: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 킴 부탱: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 펠릭스 랑젤: 前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영어권이 아니다보니, 영어권계 캐나다 영화계와 다른 퀘벡 영화라는 게 있다. 물론 캐나다 특성상 영어권 캐나다 영화계하고도 교류가 있는 편이다.
고전 배우. 서부영화나 전쟁영화 등에 자주 출연했다. 슈퍼맨의 아버지 역으로도 유명하다. 다만 성을 보면 알겠지만 프랑스계 캐나다인은 아니다. 영국계 퀘벡인이라는 특이한 케이스고 어릴때 미국으로 넘어가 데뷔한 1939년 미국 시민권을 따서 퀘벡보다는 미국인 느낌에 가깝다.
그을린 사랑과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로 유명해진 감독.
퀘벡 출신 배우 겸 감독. 호러 팬들에게는 프랑스 호러 영화인 《마터스》에 나온 걸로 유명하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출신 유대인 이민자 3세다. 영국계 퀘벡 문화권에서 성장했다.[52]
글렌 포드처럼 영국계 퀘벡인이다. 다만 포드와 달리 영어권 캐나다 영화 쪽으로 활동이 많은 편이다.
영화 감독. 그의 장편 데뷔작부터해서 지금까지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한국에서도 꾸준히 소개되어 왔다.
- 도미니크 노엘
본명 폴 알렉산더 푸르니에. 몬트리올 출신이며 현재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 활동 중.
[1] 1948년 1월 21일 제정.[2] Lieutenante-gouverneure du Québec. 부총독이 남성인 경우 남성형인 Lieutenant-gouverneur du Québec이라 한다. 캐나다 총독(Gouverneur général du Canada, 여성형 Gouverneure générale du Canada)이 임명하므로 'Lieutenant(e)'가 들어간다. 명목상 주를 대표하는 직책이지만 실권은 없다.[3] 퀘벡시와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관사의 유무이다.[4] 준주까지 포함하면 누나부트가 가장 넓다.[5] 사실 과거에 캐나다 곳곳에는 프랑스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나, 대영제국이 캐나다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팽창 시키면서 캐나다 곳곳에 살고 있었던 프랑스인들을 현재의 퀘백으로 추방시킨 안 좋은 과거가 있었다.[6] 실제로 퀘백시의 관광지로 여행을 가보면 현지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다. 사실 이렇게 외부인들에 대한 친절이 배어있는 현상은 전세계 선진국의 관광지 일대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이라면 다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이라 꼭 퀘백만의 특징은 아니다.[7] 이 표어를 언급하며 퀘벡에 대해 비꼬며 이제 그만 좀 털어내라는 등, 섬뜩하다는 식의 대사가 있다. 이 표어가 단순히 퀘벡의 선조를 기리겠다는 메세지로 받아들여졌으면 저런 리액션이 나올 이유가 없으며, 영어권 캐나다인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8] 보통 다른 캐나다 영어권 주의 차량번호판에 적히는 문구는 굉장히 비(非)정치적인 메세지들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Beautiful British Columbia, 온타리오의 Yours to discover, 앨버타의 Wild rose country 등 뭔가 자연 친화적 혹은 모험적 요소를 강조하는 반면 이런 섬뜩한 역사적 원한을 언급하는 주는 퀘벡이 유일하다. [9] 여담이지만 1977년까지만 해도 번호판에 적혔던 문구는 La Belle Province(The Beautiful Province/아름다운 주)란 평범한 문구였다.[10] 오늘날 캐나다 프랑스어에는 Sacre(사크르)라고 불리는 가톨릭 용어가 변형된 비속어가 많이 남아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프랑스 및 다른 나라에선 쉽게 통하지 않는다.[11]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정체성을 놓고 어느 쪽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지 물어서 설문 대상자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해 통계를 내는 것을 모레노 설문(Moreno Question)이라고 부른다. 스페인의 사회학자인 루이스 모레노 페르난데스(Luis Moreno Fernández)가 1986년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처음 시도했기에 모레노 설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12] 반대로 퀘벡주에도 영어를 쓰는 캐나다인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몬트리올이나 퀘벡시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프랑스어가 일상적이긴 하지만 영어도 통용된다. 다만 시골에선 프랑스어가 압도적이다. 아래 글렌 포드가 퀘벡주 출신 영어계 캐나다인이다.[13] 주로 온타리오주의 핵심경제영역에서 벗어난 북부 중앙지역 일대에 거주한다. 대표적으로 서드버리(Sudbury)와 소생트마리(Sault Sainte-Marie) 등의 도시에서 온타리오 프랑스계 커뮤니티가 명맥을 잇고 있다.[14] 르블랑은 뉴브런즈윅 출신의 아카디앵으로 대를 이어 피에르 트뤼도, 장 크레티앵, 쥐스탱 트뤼도를 따른 정치인 부자이며, 폴 마틴 부자의 경우 아일랜드계/프랑스계 혈통으로 프랑코온타리앵 가문 출신의 바이링구얼이며, 폴리에브는 아일랜드계 친모에게서 태어나 프랑사스쿠아(서스캐처원주 프랑코폰) 출신 부모에게 입양되어 앨버타에서 성장했다.[15] 다만 미국에서 퀘벡 접경 지역들은 퀘벡의 영향을 받아 역으로 프랑스어를 자주 볼 수 있는 동네다. 뉴욕주의 플래츠버그 시만 해도 영어 사인과 프랑스어 사인을 공용한다. 여기는 사실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몬트리올이라서 몬트리올의 영향이 크다.[16] 캐나다는 연방국가로 국회 선거와 주의회 내 선거가 따로 행해지며, 주의회 내 당도 연방정당과 따로 존재한다. 이러다 보니 지역 제휴정당이 없는 주도 있거나 지역정당 이름에 진보가 들어가는데 정작 실제 이념이 보수당과 가까운 경우도 생기는 편.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의 보수정당 이름이 진보보수당이다. 다만 주 내에서는 보수당 출신의 모리스 뒤플레시가 새로운 보수정당인 국가연합당을 창당, 연방 보수당과의 관계를 단절 후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해 퀘벡의 암흑기(Grande Noirceur)를 이끌게 된다. 심지어 가톨릭 교회와의 유착이 심각해 대놓고 "천국은 파란색(국가연합당), 지옥은 붉은색(자유당)" 식의 색깔론 드립을 치기도 했다.[17] 1942년 4월에 열린 징병제 도입 국민투표(65.6% 찬성으로 통과)에서는 퀘벡주에서만 반대(72.1%)가 우세했다. 이 괴리는 결국 1944년 징병제 위기로 이어진다.[18] 온타리오 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미국[19] 전쟁 이전부터 박해를 이어갔는데, 영국의 북대서양 주요 거점으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아카디앵들이 있는걸 알면서도 영국이 식민지 정착민을 계속 보냈다. 노바스코샤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영국의 첫 식민지 정착민들이 스코틀랜드 하이랜더들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이들은 7년전쟁이 북미로 번져 영국과 프랑스 정착민들의 사생결단 대격돌이 벌어지자 아카디앵들을 학살하거나 멀리 추방해버렸는데, 이들이 옮겨간 곳이 누벨프랑스의 최남단 루이지애나였고, 이들의 후손이 바로 케이준이다. 오늘날 남아있는 루이지애나 프랑스어가 캐나다 프랑스어의 일부인 아카디 프랑스어의 친척뻘 되는 언어인건 이 때문. [20] 고대 이집트에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구분과 같다. 절대 지리적 남북에 의한 선긋기가 아니다.[21] 캐나다는 주 정당과 연방 정당이 따로 굴러가는 특이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전국정당이자 2024년 현재 집권여당인 캐나다 자유당과 앨버타 자유당, 퀘벡 자유당, 온타리오 자유당은 이름만 같을 뿐 모두 제각기 전혀 다른 자유당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식적으로는 관계가 없으며 당원들 각각의 연대만이 이뤄질 뿐이기 때문에 이 동네 자유당은 좌파인데 저 동네 자유당은 우파인 황당한 정치지형이 흔하다. 연대를 하든 어쩌든 연방정당과 주 정당은 다른 정당이니까 강령도 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 퀘벡 자유당이 딱 그런 경우라 오늘날에도 퀘벡 자유당은 연방 자유당에 비해 다소 우클릭한 정당으로 평가받곤 한다. 예외적으로 신민당은 전국정당과 주별 정당을 완벽히 연동시켜놓는 시스템을 정비해놓았지만, 퀘벡주에서만큼은 이 연동이 제도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퀘벡 신민당원들은 연방 신민당에서 활동하려면 따로 입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22] 물론 이건 토론토가 몬트리올보다 미국과 더 가깝다는 지리적 요인 등도 작용하긴 했다.[23] 다만 이들 중 폴 마틴의 경우 몬트리올 지역구에서 활동한 인물이고 퀘벡 경제개발장관으로 활동하는등 퀘벡에서 정치 경력을 쌓은 인물이지만 출생지는 온타리오주이다. 아버지 폴 마틴 시니어가 윈저 쪽 지역구에서 정치를 한 캐나다 외무장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곳에서 태어났다.[24] 이 정당은 본래 캐나다 진보보수당과 캐나다 자유당의 퀘벡 주권파가 탈당하여 연방정치에서 주권파 및 분리주의의 세력을 대변하고자 만든 단일쟁점정당에 가까운 세력이지만, 퀘벡 분리주의의 세가 점차 흐려져가면서 진보정당의 색채가 짙어졌다. 일단 오늘날 연방 정치에서는 진보정당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주요 지지기반이 다른 주였다면 당연히 보수당의 텃밭이 되었을만한 퀘벡주내 교외와 시골 지역이고 주 정당들의 퀘벡식 보수주의적인 의제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는게 함정. 그런데 연방정부에서 좌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종 사회·문화적 의제에서는 퀘벡 블록 지지지역에서도 자유당 못지 않은 좌파적 여론이 나온다.[25] 신민당과 비슷한 지지층을 갖고 있지만, 신민당보다 급진적이며 프랑스의 불굴의 프랑스, 멕시코의 국가재건운동과 스탠스가 비슷하다는 평이 있다.[26] 밀, 보리, 대두, 옥수수, 카놀라 유채, 겨자, 쇠고기 등[27] 퀘벡주의 북부는 사람이 거의 없는 미개척지 침엽수림과 산악지형이다. 생로랑강 유역을 제외한 퀘벡주의 땅 대부분은 허드슨 만을 둘러싸고 있는 캐나다 순상지(Canadian Shield; Bouclier canadien)의 일부인 로렌시아 고원(Laurentia Upland; Hautes terres laurentiennes)이고, 북동쪽 래브라도 반도 방면으로는 아예 로렌시아 산맥(Laurentian Mountains; Laurentides)이 솟아 있다. 선캄브리아대부터 형성되어 수억년(...)간 지각변동 없이 침식되어온 산맥이라 최고봉이 백두대간보다 낮은 정도에 그치지만, 이들 고위도의 고지대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을 가두고 떨어뜨려 터빈을 돌리니 퀘벡주의 에너지자립이 완성되었다.(...) [28] 이름이 진짜 큰 강이다(...) 정식 명칭은 라 그랑드 리비에르(La Grande Rivière).[29] 퀘벡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1975년, 1985년~1994년에 퀘벡을 이끈 로베르 부라사 前 퀘벡주총리의 이름을 붙였다. [30] 캐나다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모이기는 하나 그 다음에는 대개 미국 방면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온타리오와 퀘벡, 그리고 대서양주의 대도시 방면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은 국경을 넘었다가 오대호를 다시 건너와서 온타리오에 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안보 문제가 캐나다, 특히 앨버타와 서스캐처원 두 주의 목숨줄을 옥죌 지경이다. 안 그래도 앨버타의 오일샌드는 WTI에 비해 황 같은 불순물 함량이 높아 정제비용이 높은데 캐나다의 자체적인 정유산업 기술 부족은 해결이 요원하고 미국은 십수년째 저유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중이다. 결국 앨버타산 원유도 정제는 미국 남부까지 가서야 이뤄질 수 있는데, 북미 대륙을 통째로 종단하는 운송비용까지 제하다보면 국제유가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이 상당히 높고 수익성은 낮다. 이 때문에 앨버타는 정유산업 발전이 힘들면 일단 아시아와 유럽 방면 수출길이라도 열어줄 파이프라인 자주화를 염원하고 있으나, 브리티시컬럼비아 북부 키티맛 방면으로는 원주민 거주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환경을 파괴한다는 논란, 그리고 대서양 방면으로는 원주민 거주지 침범 논란에다 퀘벡의 수자원 보호론까지 제기되는 중이라 다른 주들에 대한 울분이 쌓이고 있다. 그나마 기존의 파이프라인 용량을 증설하는 메트로밴쿠버 버너비 방면 사업만 연방정부의 국유화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가며 2024년에 완공했으나, 대서양 방면으로의 증설은 퀘벡에게는 정반대로 목숨이 달린 문제라서 요원하기만 하다. [31] 사실 캐나다의 서부 로키산맥에도 퀘벡에 버금가는 최적의 수력발전 여건이 갖춰진 곳이 있긴 있는데, 하필 앨버타가 아니라 브리티시컬럼비아 쪽에 있다. 자연히 BC 역시 퀘벡처럼 친환경 정책이 가속화할수록 꿀을 빨게 되고, 이는 허드슨 만 남쪽의 매니토바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앨버타의 입장에서는 "저 '친환경 방장사기맵'들이 선민의식에 쩔어 가진 것 없는(?) 앨버타를 괴롭히고 뜯어먹는다"며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32] 캐나다 전국을 통틀어 가장 기름값이 비싼 주 1위가 브리티시컬럼비아, 2위가 바로 퀘벡이다. 그런데 브리티시컬럼비아는 ICBC라는 주정부 공기업 단일보험체제의 독점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 1위지만 퀘벡주는 자동차 보험료가 저렴하다. SAAQclic 비대면 서비스 사업의 대실패로 퀘벡인들을 빡치게 만들기는 했지만...[33] 다른 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보통 2천달러에서 3천달러정도밖에 안나오며, 온타리오와 같이 아예 EV보조금 자체를 없애버린 주도 있다. 캐나다 전국을 통틀어서 퀘벡의 전기차 전환 정책이 가장 공격적이라 봐도 무방하다.[34] 죄다 CANDU식이다. 사실 캔두 자체가 온타리오 원자력공사에서 개발한 방식.[35] 퀘벡주는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초강성 독립파(Patriots)가 지배하던 뉴잉글랜드 지역과 맞붙어있는 지역이었고 대륙군의 북진 루트가 되어 가장 먼저 함락당했지만, 대륙군은 영어 사용과 개신교 개종을 강요하는 대민정책으로 프랑스계의 반발을 사다 영국군에게 패퇴했다. 오히려 영국이야말로 전쟁 직전부터 13개 식민지의 상황을 파악하며 현실감각을 갖춘 편이어서, 전운이 감돌자 영국은 원주민들과의 관계도 비교적 원만히 가져가고 프랑스계에게 가하던 가톨릭 탄압과 영어 강요 정책도 거둬들이며 민정에 신경을 썼던 편이다. 미국은 수십년이 지나 미영전쟁을 일으키면서도 가장 먼저 몬트리올을 접수하고 개신교 개종과 영어 사용을 강제하다 똑같이 역습을 당했다. [36] 캐나다의 가톨릭 대교구들 중 절반 이상이 퀘벡주 주요 도시권과 몽튼, 생보니파스, 오타와-콘월 등 프랑코폰이 많은 동네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도 온타리오와 서부지역에는 우크라이나 서부 갈리치아 출신이 많은 우크라이나계 캐나다인들을 따라 캐나다로 넘어온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의 존재감도 상당한 편이다. 반면 캐나다 서부지역에서는 캐나다 연합교회와 미국의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 교단 등 개신교세가 강하다보니 석유산업과 친환경정책의 대립, 영어와 불어의 갈등구도 못지 않게 종교 또한 서부와 동부의 오랜 지역감정에서 일정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37] 출산율을 예로 들면, 20세기 초반에는 4에 달했지만 1960년대에 조용한 혁명이라는 흐름을 타고 출산율이 단 10년만에 1명대 중반까지 급락했다. 다만 이렇게 인구구조가 급격히 뒤바뀌었다보니 60년대 이전 세대가 은퇴하면서 인구절벽과 노동가능연령인구 급감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며 후유증을 앓고 있다.[38] 일례로 피에르 트뤼도와 쥐스탱 트뤼도 부자가 다닌 Collège Jean de Brébeuf가 있다. 퀘벡주에서는 손꼽히는 명문사학이다.[39] 가톨릭의 교황 중심 관료체계 때문에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통신이 발전하지 않았던 19세기까지만 해도 가톨릭 교회 또한 나라마다, 선교단체 및 수도회마다 알력다툼을 벌이곤 했다. 조선의 천주교 박해 시절만 해도 포르투갈계 신부들에 의해 육성된 중국계 신부들과 인도차이나반도를 거쳐 남중국으로 올라온 프랑스인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은 포르투갈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세속 군주로부터의 보호권 때문에 마찰을 빚었고 이 다툼이 조선으로까지 이어졌을 정도이다. 캐나다의 당대 가톨릭 교회 역시 오대호 이서지역과 북극권 선교 사업에서는 프랑스의 오블라띠선교수도회(Oblats de Marie-Immaculée) 수도자들이 주도권을 잡았고 이들을 오타와의 연방정부와 가까운 몬트리올과 퀘벡시티 등지의 인구밀집지역 교구사제들이 돕는 형태로 이뤄졌다.[40] 서부에서 우후죽순 만들어진 가톨릭계 레지덴셜 스쿨은 사실 극초기엔 원주민과 메티스(누벨프랑스 시절 예수회 선교활동의 영향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많았다) 등을 대상으로 불어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레지덴셜 스쿨 사업은 당대인들 사이에는 일종의 종교 교단간 경쟁, 언어권간 경쟁의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수도회들이 지은 학교에서 불어 교육이 이뤄지고 개신교계 학교들이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다 가톨릭·프랑코폰·원주민·메티스 세력의 노스웨스트 무장투쟁을 이끈 지도자 루이 리엘의 처형 이후 서부에서 反프랑스어, 反원주민 여론이 강해지면서 불어교육이 금지되어서야 서부지역의 천주교계 레지덴셜 스쿨에서도 불어가 아닌 영어로의 커리큘럼 전환이 졸속으로 이뤄졌다. 당대 인력 교체와 조직구조 정비도 없이 영어조차 잘 안 통하던 교육 非전문가 신부, 수사, 수녀들에게 영어 교과서로 배워야 했던 메티스 및 원주민 어린이들의 피해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심화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톨릭은 캐나다의 언어갈등구도에서 열세에 몰린 프랑코폰들의 문화적 정체성과도 같았고, 퀘벡인들은 레지덴셜 스쿨 논란에서 영미권 정체성 정치의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일률적으로만 이뤄지는 가톨릭 비판에 대해서도 일말의 이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41] 정확히는 주정부가 영주권을 주는건 아니고 주정부에서 신청자들 중에 뽑아서 연방정부에 신청을 하면 CRS 점수 600점을 주는거긴 한데, 어차피 Express Entry 평균 커트라인 점수가 높아봤자 500점대 후반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법체류같은 불리한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운이 더럽게 없는게 아닌 이상(...) 사실상 뽑히기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42] 불어 B2를 딸 수 있다는 가정 하에[43] 특히 아이들이 영어학교만 다녀 왔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 불어과목을 통과해야 하는 요구사항[44] 현재 퀘벡주에서 유학생 부모의 자녀가 무상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공립 컬리지나 대학교의 정규 학위 또는 디플로마 과정(Post-secondary level)에 등록해야 한다.[45]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46] 여기선 아예 몬트리올 대학교는 유럽언어기준 B1~B2 프랑스어 실력이 있어야 교환수업이 가능하다.[47] 여담으로 아랫동네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퀘벡주로 잘 안 오는데, 미국 명문대도 많은 지역이라 선택 가능한 대학이 많기 때문이다.[48] 그러나 상당수 선수들이 비프랑스어권 선수들이긴 했다. 매츠 선딘, 조 새킥, 그리고 페터 포스베리 등은 한때 퀘벡 노르딕스에서 스타 플레이어들로 명성을 쌓았던 비프랑스어권 선수들이다.[49] 캐나다의 나머지 지역들은 퀘벡 주와는 달리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다.[50] 밑에 언급된 기욤 패트리도 이 때문에 비정상회담에서 '이건 프랑스어가 아니다'는 디스를 당했다.[51] 2025년 7월 1일 '캐나다의 날(Canada day)'에 O Canada의 피아노 독주 편곡 연주 영상을 X에 업로드한 것을 보면 여전히 캐나다를 조국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52] 그가 다닌 웨스트 힐 고등학교는 영어 몬트리올 학교 연합에 속해있다.[53] 아버지가 현직 총리일 때 태어난 고로 출생지와 유년기 성장지는 온타리오주 오타와이지만,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는 몬트리올이다.
![]()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